 |
김기협 역사학자 |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2000)를 다시 읽고 있다. 언젠가 읽기는 읽은 책인데, 완전히 새로 읽는 기분이다. 전에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 책 내용과 관련된 연구와 정리가 그 사이에 매우 활발하게 이뤄져 왔고, 그 상당 부분을 내가 근년 집중해서 검토해 왔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관점도 가능하구나.” 무심히 지나쳤던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문명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여기에 포메란츠의 공헌이 작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제에 표시된 것처럼(“중국과 유럽, 그리고 근대 세계 경제의 형성”)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전체의 근대화 과정을 고찰한 책이다. 인도, 중동, 동남아 등 유라시아대륙의 다른 문명권에도 2차적 조명이 비춰져 있다. 남양(동남아)에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니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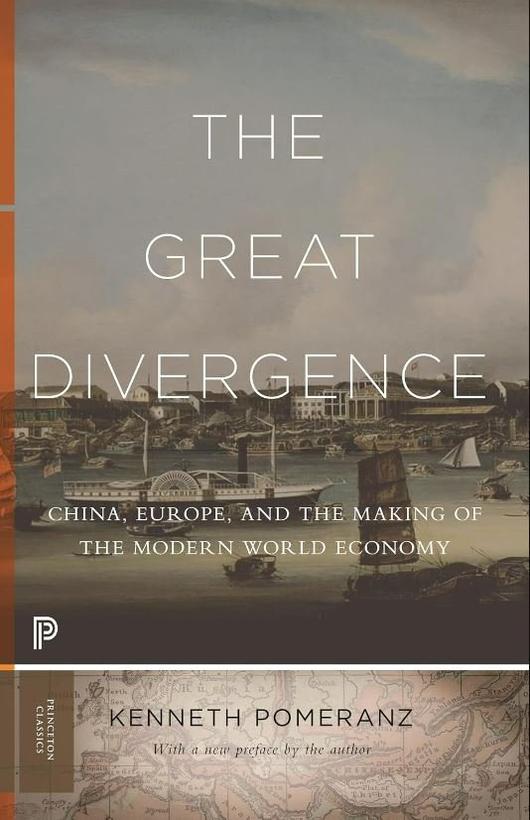 |
Kenneth Pomerant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2000) |
━
내면을 향한 성장의 길 인불루션
이번에 생각을 많이 쏟게 된 개념이 ‘인볼루션(involution)’이다. 전에는 접두사 “in~”과 “e~”의 차이를 떠올리며 ‘진화(evolution)’의 대칭 개념인가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읽으면서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말로 적절한 번역어도 나와 있지 않다. ‘역행’, ‘퇴행’, ‘복잡’ 등 시도가 있으나 사회과학 개념으로 ‘인볼루션’의 뜻이 잘 담기지 않는다.(수학, 생물학 등 다른 분야에서는 각각 다른 뜻으로 쓰여 왔다.) 이 개념이 큰 주목을 받은 중국에서는 ‘네이쥐안(內卷)’이란 말이 쓰이는데, 한자어 번역으로는 적합해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개념을 많이 다루게 되면 ‘내권’으로 쓰게 되기 쉬울 것 같다.
‘인볼루션’을 사회과학 개념으로 처음 쓴 것은 클리포드 기어츠의 〈농업의 인볼루션: 인도네시아 생태학적 변화의 과정〉(1963)이다. (나는 아직 읽지 못한 책이다.) 자바, 발리 등 집약적 벼농사 지역에서 인구 증가의 압력 아래 기술과 제도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력 투입의 증가를 통해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늘리는 길로 나아간 현상을 가리킨다. 노동력의 생산성이 아니라 자본(토지)의 생산성을 늘린 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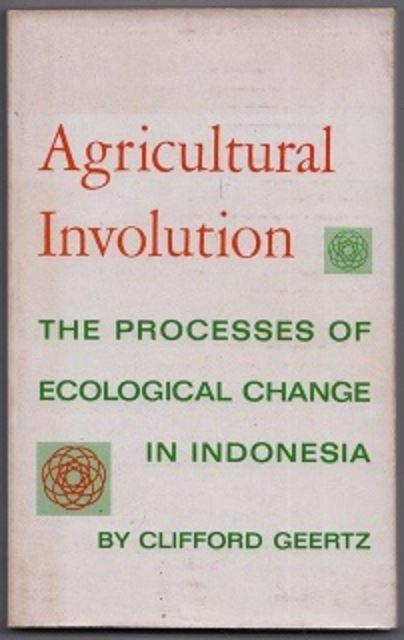 |
Clifford Geertz,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e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1963) |
노동력 투입의 증가에 관해서는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의 개념이 나와 있다. 도쿠가와시대 일본의 농업생산력 발전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인데, 조반니 아리기가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스기하라에 따르면, 경제적 향상을 추구하면서 비인적 자원보다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이 같은 성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경제 내에서 서구 기술을 통합하려고 하던 때에조차도, 계속해서 동아시아 발전 경로의 특징이 되었다. (...) 스기하라는 이 이종 교배의 발전 경로를, ‘서구 경로보다 노동을 더 전면적으로 흡수하고 이용하면서 기계와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것에는 덜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화’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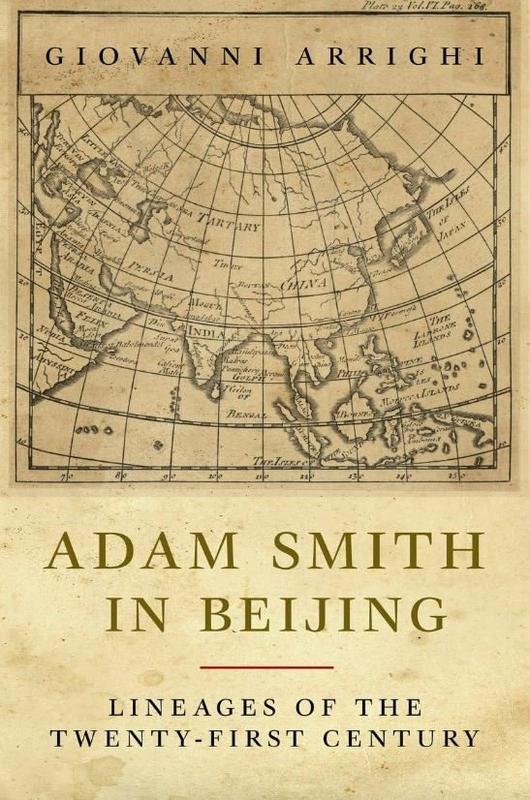 |
Giovanni Arrighi, Adam Smith in Beijing (2007, 강진아 옮김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2009)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레볼루션은 ‘성공’, 인볼루션은 ‘실패’?
근면혁명과 인볼루션 개념이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19-20세기 ‘치욕의 시대’를 해명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치욕의 원인으로 근대화의 실패가 지목되어 왔는데, 과연 중국의 경험을 ”실패“로 꼭 단정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시작된 ‘굴기’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확산되는 생각이다.
근대화의 주역인 유럽인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은 1-2차 세계대전의 파국을 겪으며 일어났다. 조지프 니덤이 1950년대에 시작한 〈중국의 과학과 문명〉 프로젝트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비-유럽 문명과 유색인종을 열등한 존재로 보던 오랜 통념에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중국의 과학과 문명〉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부 연구자들(1988). 조지프 니덤(1900-1995) 사후에도 니덤연구소가 편찬을 계속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의 과학과 문명〉은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된 고찰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의 균열만을 일으켰다. 그러나 큰 둑의 붕괴도 조그만 균열에서 시작된다. 1970년대에 고립을 벗어난 중국의 발전이 계속되고 중국인의 학술 활동이 자라나는 데 따라 중국의 근대사를 ”실패의 역사“로만 보던 시각은 사라졌다.
중국 근대사의 복권(復權)은 유럽중심주의의 퇴조를 확인하는 선두주자였다. 포메란츠와 아리기가 21세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대분기〉와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에서 중국에 초점을 맞춘 데는 중국과 중국사에 관한 연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쌓여 있다는 이유도 있다.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 이슬람권, 힌두권 등 다른 문명권의 역사에도 뒤따라 적용되고 있다.
━
자원 공급의 급격한 확대가 만들어준 돌파구
기어츠가 인볼루션 개념을 자바-발리 지역 연구에서 내놓은 것은 그가 연구활동을 그 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유럽 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널리 일어난 현상이었고 1980년대에 필립 황과 (The peasant economy and social change in North China) 프라센지트 두아라가 (Culture, Power, and the State: Rural North China, 1900-1942) 중국사에 이 개념을 적용한 연구를 내놓았다.
기어츠는 이 개념을 미술사에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고딕건축이나 마오리족의 조각처럼 하나의 형태가 완성된 후 그 틀을 바꾸지 않고 같은 틀 안에서 내부의 장식을 한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조직의 틀 하나가 만들어진 뒤 그 틀 안에서 복잡성만 늘어나는 현상을 ”인볼루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인간세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틀을 바꾸는 데는 평소보다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특별히 큰 자원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볼루션이 일종의 정상상태(normal state)이고, 큰 자원 투입이 있을 때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으로,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 이론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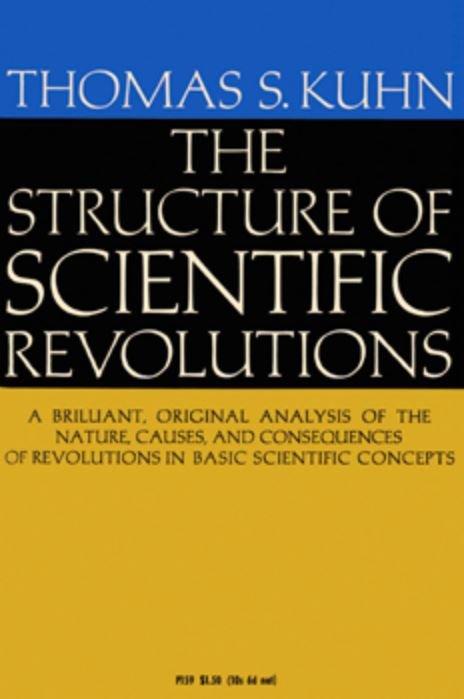 |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1962). 쿤이 그려낸 ”과학혁명의 구조“는 다른 분야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도 하나의 유력한 모델이 되었다. |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문명 발전의 돌파구가 터지기 쉬운 곳이다. 문명의 역량이 응집되고 인구 압력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18세기에는 유럽 외에도 중국, 인도 등 여러 곳에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포메란츠는 본다. 그런데 19세기 들어 유럽에서 유독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다른 지역들과 사이에 ”대분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틀을 지키는 인볼루션이 진행되었는데 유럽에서 틀을 바꾸는 레볼루션이 일어난 것은 특별히 큰 자원 투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포메란츠는 설명하면서 영국의 석탄자원 개발과 아메리카 신대륙 개척을 꼽는다. 영국의 석탄자원은 몰라도 신대륙 개척이 결정적 조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
‘새 땅’의 정복 과정으로 읽는 역사
‘신(新)대륙’이란 용어 자체에 반감을 느끼기도 한다.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을 무시하고 없던 땅이 생겨난 것처럼 보는 정복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보다 피해자 입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지만 문명의 역사에는 가해자-피해자 구분의 필요가 없다.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는 구대륙에 비해 인류 정착이 늦고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었다. ‘발견’ 이후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맡은 역할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새 땅“이란 이름에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유럽인의 아메리카 정복이 규모가 크고 대단히 폭력적이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새 땅’의 정복은 문명권의 확장 과정에서 보편적 현상이었다. 3천년 전 허난(河南)성 일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던 ‘중국’이 대륙국가로 자라나는 과정에도 문명 수준과 인구밀도가 낮은 ‘새 땅’의 정복이 수없이 거듭되었다.
3천년 전 남양인(Austronesians)의 확산도, 그 후 여러 인구집단의 남양 이주도 일련의 ‘새 땅’ 정복이었다. 그 이전의 원주민은 네그리토(Negrito) 등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남양의 역사에도 정복의 역사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다.
16세기 유럽인이 도착할 때 남양은 인구 분포에 편차가 큰 상태였다. 13-15세기 ‘통상의 시대(age of commerce)’에 활발하게 일어난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다. 가장 가치가 큰 상품이던 향료의 생산지와 교역로 일대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남양 근대사에서도 유럽인의 역할을 전보다 줄여서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인이 일으킨 변화를 수면의 물결로 보고 바닥에 깔린 현지 사회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18-19세기 말레이반도의 인구 증가와 중국인 도시 싱가포르의 탄생도 기본적으로 현지 사정에 따른 변화이며 이를 거들어준 것을 영국인 지배자들의 역할로 보는 쪽이 더 타당할 것 같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