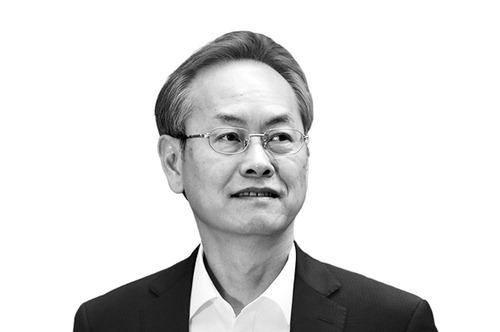 |
지난여름 짧은 몽골 여행에서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싶었다. 제국은 어떻게 그토록 빨리 일어났을까. 왜 그토록 빨리 무너졌을까. 나는 곧 욕심이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실마리는 잘 보이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거대한 기마상을 보고 초원의 게르에서 하룻밤 잔다고 풀릴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나는 거대 기업을 제국으로 그리곤 했다. 베어링과 로스차일드는 금융제국이었다. 포드와 GM은 자동차제국이었다. 가속의 시대 기업은 질풍노도였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반세기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세계 정상을 다툰다. 아마존은 불과 30년 전 태어났다. 메타는 20년밖에 안 됐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마지막 2년 새 빅뱅을 일으켰다.
기업이 제국이라면 제국을 기업으로 볼 수도 있겠다. 몽골은 13세기의 스타트업이었다. 제국은 온갖 혁신의 산물이었다. 몽골군은 기동성이 뛰어났다. 헝가리로 진군한 용장 수부타이는 사흘 만에 300㎞를 달렸다. 중무장한 유럽 기병은 탱크처럼 돌진할 줄만 알았다. 날렵한 몽골 기병은 후퇴할 때도 몸을 틀어 활을 쏘았다. 자유자재로 몸을 쓸 수 있게 해준 등자부터 작아도 위력적인 합성궁까지 숱한 혁신이 빛을 발했다. 유럽은 지휘관을 혈통으로 정했다. 몽골은 능력을 봤다. 제국의 역참은 그 시대 고속통신망이었다. 뒤떨어진 과학기술은 빠른 학습으로 따라잡았다. 적진에서 데려온 공성 기술자를 앞세워 적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제국은 곧 분열됐다. 권력 승계는 내전을 불렀다. 정복을 멈춘 지배층은 안주하고 부패했다. 14세기 후반에는 중국에서 몽골 초원으로 쫓겨났다. 태평양부터 동유럽까지 한반도의 100배 넘는 땅을 아우른 팍스 몽골리카는 사람과 상품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했다. 하지만 파괴적인 무기와 치명적인 전염병도 옮겼다. 유럽은 더 발전한 대포로 무장했다. 흑사병의 재앙 후 활력은 더 높아졌다. 혁신자본이 바닥난 제국은 스스로 몰락하고 모험적인 스타트업이 무섭게 자라나는 동학이 되풀이됐다.
기업 제국은 그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 휴대폰 시장을 제패했던 노키아 몸값은 전성기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번 세기가 시작될 때 인텔의 몸값은 엔비디아의 30배를 넘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조지프 슘페터는 20세기 초 합스부르크 제국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도 기업과 제국의 강렬한 은유를 썼다. 슘페터는 경쟁하고 정복하려는 의지와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욕망이 기업가를 움직인다고 봤다. 성취는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로 가능하다. 그것이 없으면 지난날의 성공은 독이 된다. 기업가정신과 혁신역량이 소진되면 급격히 몰락하는 건 기업도 제국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제국의 경쟁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처음에는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한다. 그다음에는 서로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싸운다. 나중에는 합종연횡하며 적과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다. 혁신 경쟁보다 지배권 다툼에 몰두하다 스스로 무너진다. 몽골제국은 칭기즈칸과 쿠빌라이칸의 정복욕과 용맹함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었다. 놀라운 기동성과 공격 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다. 제국의 지배자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답하지 못했다. 기업의 영속성도 마찬가지다. 기술보다 업의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
울란바토르 거리는 온통 주차장이었다. 일제 퇴물 자동차가 넘쳤다. 제국의 기억은 까마득했다. 그 흔적은 박물관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 오래전 발 아래 두었던 두 나라는 강대국이 됐다. 몽골은 그 틈에서 숨죽이며 살았다. 제국의 수수께끼는 한국 기업에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돼야 한다. 몽골제국처럼 빨리 일어난 기업들은 이 가속의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 작가·전 매일경제 논설실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