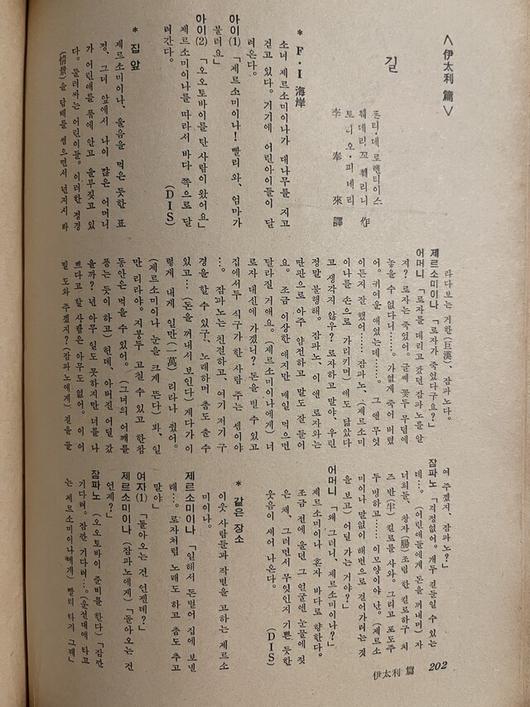 |
1963년 신구문화사가 발행한 ‘세계 전후 문제 희곡 씨나리오집’의 일부. 필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영준 | 전 열린책들 편집이사
1984년, 스위스의 한 출판업자가 요즘 대세라는 연극 한 편을 관람했다. 이게 아직 책으로 나온 적이 없음을 확인한 그는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희곡을 책으로 내자고요?” 잘못 들었나 싶었던 작가는 반문했다. “돈을 날리고 싶으시다면야….” ‘콘트라바스’는 그해 출간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에 나온 한국어판은 10만권 가까이 팔렸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이 희곡이 여러 공연 기록을 경신한 흥행작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는 책으로 팔릴지 회의적이었다. 왜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지는 서점에 가보면 알 수 있다. 희곡은 팔리지 않는다. 한국뿐 아니라, 극장 소식을 신문 문화면의 제일 상석에 배치하며 떠받드는 독일어권에서도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다. ‘콘트라바스’가 팔린 것은 모노드라마라서 얼핏 1인칭 소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출판사 영업부의 임무는 이 책이 희곡 서가로 들어가는 불상사가 없게 하는 것이었다.
왜 소설은 팔리는데 희곡은 안 팔리는가? 그 포맷이 독자들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안 팔릴 게 뻔하니 광고도 하지 않는다. 희곡만 읽고 그 연극을 안다고 할 수 있을지도 좀 애매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장르의 특성이 책과 이질적이다. 전승되는 이야기, 즉 서사시는 인쇄물의 발전과 결합하여 장편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진화했다. 얼마 전까지 ‘책을 읽는다’고 하면 대개 장편소설 읽는 것을 뜻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반대로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벤트인 연극은 책보다는 일종의 경기장, 즉 극장에 적합하게 진화했다. 희곡이 책과 영 멀어진 데에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축구를 좋아한들 경기 내용을 기록한 책을 직접 시합을 구경하는 것보다 선호할 사람은 없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희곡의 가능성도 바로 이 점에 있지 않을까. 중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희곡을 교사가 배역을 정해서 낭독시키면 평소 수업에 소극적인 아이들도 열심히 참여하곤 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센스를 드러내며 말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희곡은 문학이라고 하지만, 절반은 체육 비슷한 것인지도 모른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외에는 아무 역할도 주어지지 않는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어떤 역할을 맡은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2년 전 영화 ‘헤어질 결심’의 시나리오가 책으로 출간되어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되는 이변이 있었다. 그 뒤 ‘나의 해방일지’ 같은 드라마 대본이나 ‘비정성시’ 등 고전 영화의 시나리오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는 일은 드물지 않게 됐다. 마침내 희곡이나 시나리오 읽을 때의 위화감이 극복된 걸까? 세계 최초로? 어느 각본집에서 이런 지문을 봤다. ‘이제 그가 놀랄 차례다.’ 이게 동작 지시문인가? 차라리 소설 구절에 가까운 것 아닐까? 진실은 이런 상황 설명적 지문이 배우와 스태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이제는 이미 영화를 본 독자까지 이를 알려고 한다. 영상에는 불확실했던 감정적 맥락의 해답을 얻기 위해 말이다.
30년 전, 영화 하나가 흥행하면 누가 썼는지도 모를 영화 소설들이 대여섯 권씩 급조되곤 했다. 이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살 사람도 없는 책들이다. 지금 독자들은 진짜만을 원하므로 가짜 영화 소설 대신 각본집을 산다. 하지만 여전히 듣고 싶은 것은 어느 장면, 어느 표정에 대한 설명일지 모른다. 감정은 낱낱이 해명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불안함이고 집착이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3주년 굿즈이벤트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