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얼핏 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장서를 구매하는 일이 많다. 지난번 서점에서 산 책들이 책장에 쌓였는데 또 책을 구매하며 쟁여두는 것이다.
'저번에 산 책도 아직 다 못 읽었으면서 또 책을 사느냐'고 질문하면 그들의 답은 대개 이렇다. "산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산 책들 중에서 읽는 것이다." 그러고는 마치 책에 감염된 듯이 책장을 서성이면서 바지런하게 책을 모으고, 또 모은다.
오경철 작가의 '아무튼, 헌책'은 헌책 수집가인 저자가 헌책의 본질을 사유하는 책이다. 저자는 '애호의 대상'으로서 헌책을 갈망해왔는데, 헌책에 관한 농밀한 사유가 펼쳐진다.
모든 책들은 1쇄를 뜻하는 초판(初版)의 모습으로 세상에 잉태된다. 노벨상을 받은 유명 작가의 책이든, 이제 첫 책을 내는 무명 작가의 책이든 그들의 초판은 싱싱한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2쇄, 3쇄가 거듭되면서 초판의 책등과 종잇장 사이엔 시간이라는 무형의 더께가 얹힌다. 그리고 다른 책의 초판이 홍수처럼 쏟아지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서점 귀퉁이의 한자리를 내어준 뒤 서서히 독자로부터 망각될 운명을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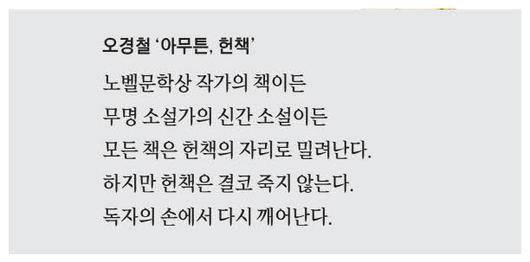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런 책들은 어디가로 흩어진다. 운 좋은 양서는 독자의 기억과 함께 책장에 소중히 보관되지만, 짐이 된다는 이유로 1000원에 중고로 팔려나가는 책들도 다수다. 헌책방은 그래서 죽은 책들의 공간이다.
하지만 저자는 죽어버린 줄만 알았던 책이 다시 얻는 생명력의 순간을 이야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잊힌 헌책은 '수면'에 빠진다. "그것은 죽음과 비슷한 잠이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아예 깨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헌책의 무덤인 헌책방에서 독자가 그 책을 발견해 펼치면 헌책의 깊은 잠은 종료된다.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고 헌책을 사들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보물과 같다.
그런 점에서 헌책방은 "책들의 우주"라고 저자는 쓴다. 헌책방은 책의 우주이고, 동시에 책에 남은 흔적들의 우주라는 것. 따라서 헌책방을 방문하는 건 책 한 권에 담긴 우주를 유영하는 일과 같다. 마음에 드는 책이란 모름지기 '또 다른 자신'을 만나는 일일 텐데, 저자는 "진정한 사냥꾼의 일차적인 관심은 사냥 그 자체"라는 움베르토 에코의 금언(金言)을 인용하면서 '헌책 탐닉'의 숭고성을 들려준다.
때로 그런 책이 있다.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서 더는 그을 곳이 없다고 느끼지만 다시 펼칠 때마다 또 밑줄을 긋게 만드는 그런 책.
두 번, 세 번의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볼 때마다 마치 처음 보는 것과 같은 환희와 고통의 감각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책. 그런 책을 헌책방에서 만날 때마다 기자는 그 책을 구매하는 편이다. 나 이전의 독자가 왜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는지를 홀로 상상하면서, 긴 침묵에 동참하고자 계산대 앞에 서는 순간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