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소뱅, 2019년 출혈경쟁 끝내고 구글 대응 합심
스마트스토어·인터넷은행 등 주요 사업마다 소뱅에 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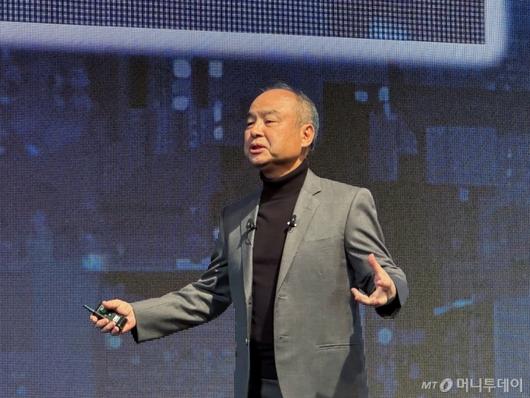 |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사진=도쿄 로이터=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의 '라인야후' 강탈 사태는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조짐이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친 두 회사는 경영통합 후 유기적 협업을 펼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손정의(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만나 경영 통합을 제안할 때부터 이 같은 '강탈'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일본 IT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소프트뱅크의 결제앱 '페이페이'는 2018년 12월 100억엔(당시 약 1080억원)을 투입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간편결제 1위에 올랐다. 페이페이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파격 혜택을 내세웠다. 라인페이를 통해 결제앱 시장에서 경쟁하던 네이버도 맞불을 놨다. 대대적 마케팅을 통해 300억엔(당시 약 3250억원)을 뿌렸다. 라인페이를 쓰기만 하면 1인당 1000엔을 줬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그 외에도 다양한 시장에서 부딪혔다. 라인이 인수한 일본 배달앱 1위 데마에칸과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2위 우버이츠의 경쟁 등이 대표적이다.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2019년 7월 4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찬을 위해 회동 장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결국 양사는 출혈경쟁으로 자금력이 소진될 경우 구글과 위챗 같은 빅테크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19년부터 한 몸이 돼 협력하기로 했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을 통합해 시너지를 낼 경우 아시아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빅테크에 대항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협업 형태는 중간지주사 Z홀딩스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50대50의 지분을 보유한 'A홀딩스' 체제가 됐다, 현재 A홀딩스가 라인과 야후재팬의 모든 사업체를 총괄하는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 지분 64.5%를 보유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 통합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라인을 이용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은 이미 이커머스 업체들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의 적극적 협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영통합 당시 공개했던 페이페이와 라인페이 통합 역시 일부 서비스의 미미한 연동에 그쳤다. 오히려 2018년부터 라인과 일본 미즈호금융그룹이 함께 추진하던 인터넷은행 '라인뱅크'가 소프트뱅크의 입김을 받아 지난해 3월 설립을 전면 철회하기로 하는 등 양사의 경영통합은 네이버의 일본 진출에 '독'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역시 네이버와의 '50대50' 협정 때문에 라인야후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주기적으로 나왔다. 특히 라인이 일본 공공서비스에서 역할이 커 일본 정부의 의향을 전격 반영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이 틀어쥐게 만들자는 의견이 극우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최고경영책임자) 역시 지난 9일 결산발표회에서 "A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한다면 보다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다양한 전략이 가능해진다"며 지분 욕심을 드러냈다. 다만 "소프트뱅크의 현금흐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며 최소한의 자금을 투입해 라인야후의 지배력을 가져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매각 협상에 임하는 데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헐값에 최소한의 지분만 넘겨줄 경우 네이버 경영진에 대한 배임 이슈가 나올 수 있어, 자사 이득 최적화 방안을 찾는 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