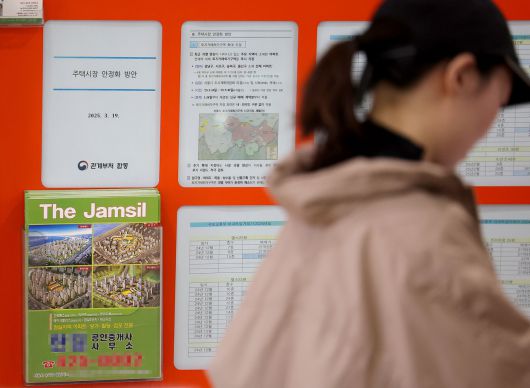한국은행, 27일 ‘금융안정 상황’ 발표
상환 위태로운 ‘고위험가구’ 38.6만 기록
집값 떨어진 지방 중심 추가 악화 가능성
지방 소재 은행 건전성 위협할 우려 커
내수 위축에 취약 자영업자도 지속 증가
국내 금융 취약성 키우는 3대 뇌관으로
지방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위태로운 고위험가구가 늘고, 이에 따라 지방 소재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위축에 따른 취약 자영업자 수 증가도 고질적인 건전성 위협요인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붙어 있는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위태로운 ‘고위험가구’가 40만 가구에 육박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소득 기반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고연령층이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관련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 소재 은행 건전성에도 당장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내수 위축 여파로 인한 취약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잠재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위험가구 ▷취약 자영업 차주 ▷지방은행이 국내 금융의 3대 뇌관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위험가구는 2024년 기준 38만6000가구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 가구의 4.9%를 차지했다.
고위험가구의 수 및 금융부채 비중은 금리 부담이 컸던 2023년(각각 3.5% 및 6.2%)에 비하면 줄었으나 장기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가구 수 기준 고위험가구 비중 장기평균은 3.1%다.
소득 또는 자산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모두 356만6000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58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 가구 수의 29.7%, 전체 금융부채의 39.7%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이다. 지방 고위험가구의 중위값 기준 DSR 및 DTA는 각각 70.9%, 149.7%다. 언뜻 보면 평균과 별 차이가 없지만, 연령 구성을 보면 얘기가 다르다. 지방 고위험가구의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중은 18.5%에 달했다. 수도권(5.1%)의 3배가 넘는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득 기반이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방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단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지방 아파트 가격은 0.04%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방 집값이 폭락하면 DTA가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흔들린다.
한은은 “지방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지방 주택가격의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 3대 뇌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 부동산 관련 대출이 흔들리면서 지방 소재 은행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2024년 4분기말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4%로 시중은행(0.32%)을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시장 상황이 차별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 위축으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뇌관으로 지목됐다.
2024년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2만7000명을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말 115조7000억원에서 2024년말 125조4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