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희망이냐 절망이냐” 압박 발언
군 관계자 “준비 할 뿐, 국방부가 결정 안 해”
코로나19 명분, 축소된 형식으로 진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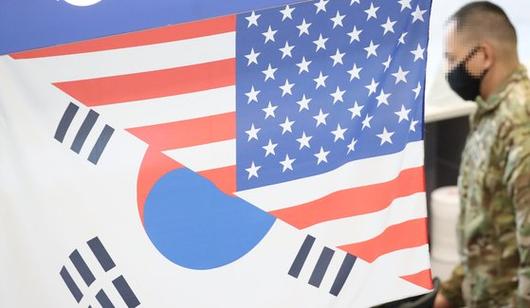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주한미군. 사진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년 8월 열리는 한ㆍ미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가 연일 화제다. 군 안팎에선 최근 “훈련 하나요? 안 하나요?”라며 인사말을 주고받을 정도다. 여기에 정부와 군 당국에서 누구 하나 “한다, 안 한다” 시원스럽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를 내고 이달 예정된 연합훈련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구한 것에 대한 청구서 성격이라는 해석이다.
 |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청와대에서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한ㆍ미 군 당국은 2018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연합 지휘소 훈련만 할 뿐 대규모 연합 기동훈련(FTX)은 유예하고 있다. FTX훈련은 소규모(대대급 이하)로 나눠 진행한다. 한·미는 이전부터 8월엔 지휘소 훈련을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전면적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 김 부부장은 1일 담화에서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지하 벙커에서 한ㆍ미 군 장병이 연합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미 공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달 30일 이뤄진 한ㆍ미 국장장관 전화통화에서 이번 훈련 실시 여부에 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국방부는 “다양한 국방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ㆍ미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훈련 취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 기조를 이어가고 싶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고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이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주한미군. 사진 주한미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병력 보호는 한미연합사령부 제1의 우선순위이며 모든 한미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최소 인원만 투입하는 축소된 형태의 연합훈련 실시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미 본토에서 최소 인원만 한국에 들어와 훈련했다. 계획된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민을 반영해 훈련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전망이다.
 |
주요 한미연합훈련 진행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한국 정부는 연합 훈련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필요한 검증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이를 건너뛰기 어려운 입장도 있다.
지난해 이미 코로나19 감염증 여파 등에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연습 규모를 축소한 경험이 있다. 24시간 쉴 틈 없이 진행하던 훈련 시간은 반나절 수준으로 줄여 열흘간 진행했다.
2019년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빼고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조정했다. 지난해도 ‘20-2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정했다. 한미 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에 트집거리를 잡히지 않으려 ‘동맹’이란 표현을 피했다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왔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훈련 실시 여부는 국방부가 아니다 다른 곳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철재ㆍ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