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판결과 정의』출간 기념 기자간담회
조국 논란, 김영란법 등에 대해선 대답 회피
 |
17일 신간 『판결과 정의』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 창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선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김영란(63) 전 대법관이 신간 『판결과 정의』(창비)를 펴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기에 사법부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됐던 그는 6년간 대법관을 지냈고, 현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신간은 제목 그대로 판결의 '정의'를 다룬 책이다. 전작인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2015)가 대법관 재임 기간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아봤다면, 신간은 그가 퇴임한 뒤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되짚으며 다양한 이론을 통해 판결의 의미를 해부한다. 김 전 대법관은 "판결 과정에서 다뤄졌던 다양한 정의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판결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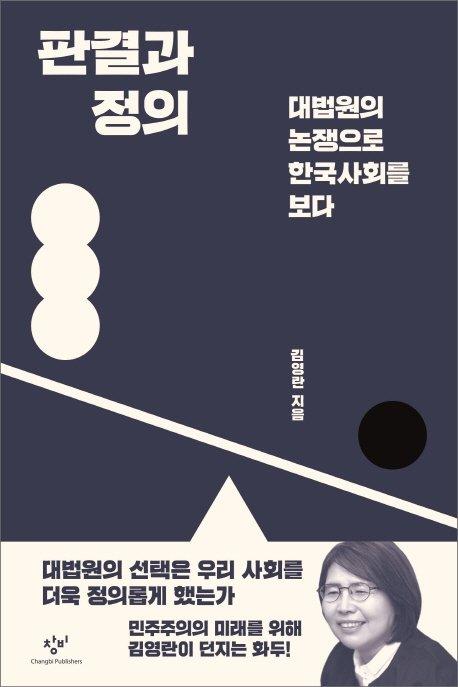 |
책은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소송' '가습기살균제 사건' '강원랜드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X파일 사건'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다뤘다. 김 전 대법관은 "이런 사건들은 가부장제, 자유방임주의, 과거사 청산, 정치의 사법화 등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와 관련 있다"며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석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저자는 첫 장에서부터 최근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성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퍼지면서 가부장제가 해체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그 변화를 다소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여러 판결을 보면 대법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색하게나마 긍정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
김영란 전 대법관이 좋은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창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전 대법관은 좋은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을 모두 이해시킬 수 있는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만약 판사가 '재판부가 당신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법원이 도와줄 방법으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자세로 당사자들을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그 재판은 좋은 재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판결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판결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되지만, 판결 속에서 쟁점이 됐던 가치에 대한 고민은 끝나면 안 된다"며 "지난 판결을 돌아보며 판결이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 살펴보고, 사법부 판단이 더 옳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통념과 공감대를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서였다. 일부 기자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은 소감을 묻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신간 출간을 기념해 출판사에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정아람 기자 a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