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임브라(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cheho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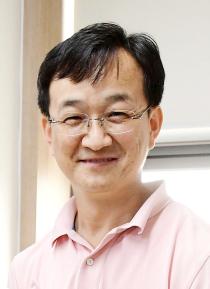 |
포르투갈에선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명절처럼 부활절 연휴와 성탄절 연휴에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티를 즐긴다. 이 날이 가까워지면 대형마트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식재료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 중에서도 분주한 곳이 바칼라우(bacalhau) 판매 부스다. 바칼라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선 ‘대구’의 포르투갈어 이름이다. 대형마트 생선코너에 진한 짠 내와 말린 생선냄새가 어우러져 있는 매대에 1m 정도 길이의 생선이 널찍하게 펼쳐져 소금 범벅으로 진열돼 있는데 그 것이 바로 바칼라우다.
바칼라우는 포르투갈의 ‘소울 푸드’다. ‘매일 하나씩, 365가지의 바칼라우 요리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고 실제로 찌고 튀기고 굽고 비비고 끓이고 크림으로 만들어 빵에 넣는 등 조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적용된 바칼라우 요리는 1000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포르투갈인들의 바칼라우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르투갈 바다에서는 잡히지도 않는 바칼라우가 어떻게 ‘국민 생선’이 됐을까?
그 역사는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바칼라우는 중세 북부 사람들에 의해 포르투갈에 소개됐다. 14세기에는 영국과 포르투갈 사이에 무역 조약이 맺어 포르투갈의 소금과 영국의 바칼라우를 교환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처럼 염장한 바칼라우가 나온 것은 1497년 포르투갈인들이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찾던 중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대규모 바칼라우 어장을 만나면서부터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풍부한 어장을 발견한 포르투갈인들은 잡은 바칼라우를 효과적으로 보존해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나무통에 담아 굵은 소금에 묻어두었다. 염장한 바칼랴우는 삼투압 현상으로 육질에 수분이 빠져 건조해지고 부피도 줄어들어 제한된 공간에서 보관하기가 용이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소금 덩어리나 다름없는 염장 바칼라우지만 요리가 돼 나온 걸 보면 잘 해동된 동태처럼 육질이 부드럽다. 유명한 바칼라우 레스토랑에 가면 입구에 대형 수조를 설치해 바칼라우의 소금기를 제거하고 육질을 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는 72시간 동안 깨끗한 물에 담가 놓으며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주는 게 비결이다.
현재 포르투갈에 유통되고 있는 염장 바칼랴우는 노르웨이산이 가장 많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12만4000톤의 바칼랴우를 포르투갈로 수출했다. 이는 노르웨이 전체 수출량의 36%에 해당한다. 노르웨이 해산물 위원회(NSC)의 데이터에 따르면 포르투갈인 1인당 평균 바칼랴우 소비량은 연간 약 15kg. 전체 대구 소비량의 30%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뤄진다.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명절 음식이 남으면 한 데 모아 ‘섞어찌개’를 끓여 소비하곤 하는데 이 나라에서도 가족파티에서 남은 바칼라우를 포르투갈 배추와 함께 넣어 스프를 끓어 먹는단다. 이 뿐만 아니라 바칼라우는 재활용 레시피도 다양해 여기에선 버릴 것 하나 없는 ‘국민 생선’이다.코임브라(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chehot@naver.com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