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종택 논설주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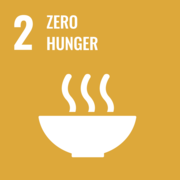 |
[SDG2 기아종식] 사람이 먹지 않고는 생존이 어렵다. 요즘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발달로 기술집약적인 공산품이 대량 생산돼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에 농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하지만 어쩌랴. 식량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요소인 것을! 그래서 오래전 중국 한나라 문제 때 "서에 "농사는 하늘 아래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백성은 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바이다(農者天下之大本也 民所恃以生也)"라고 했던 것이다.
옛날 사농공상을 따지던 시절에도 농민은 선비들 다음으로 쳐 주었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민은 식량을 생산한다는 데 큰 긍지를 갖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농사는 쉬운 게 아니다. 입쌀을 뜻하는 '미(米)'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十八'로 벼 낟알 하나 얻는 데 여든여덟 번 손길이 간다는 뜻이다. 물론 이 같은 정성에다 좋은 품종, 농업기술 등이 어우러져야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쌀밥 먹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 그림은 과거 한국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통일벼'이다. 이 통일벼 종자가 아프리카 기니에 보급된 지 2년 만에 풍요로운 수확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현지 벼 품종으로는 1헥타르 당 수확량이 쌀 1톤 뿐이었지만 통일벼로는 4~5톤을 거둘 수 있어 '기적의 쌀'로 불려 아프리카 기아 퇴치에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기니는 1년 내내 기온이 30도 수준인 데다 비도 많이 와 통일벼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우리 통일벼로 이모작을 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선 3모작까지 가능하다. 이럴 경우 기존 기니 벼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수확량이 최대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거 한국처럼 매년 여름마다 보릿고개를 겪는 기니는 전체 인구의 35%가 식량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세계식량계획(WEF)은 2년 전 통일벼 볍씨 10kg을 시작으로 기니에서 기근 해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불과 1~2년 전인데 그때는 한 끼만 먹고 고통스러워하고 영양실"도 많았는데, 이제 굶주림에서는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전언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 식량난을 해결해준 통일벼가 아프리카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주도해 통일벼가 아프리카에 적합한 품종이라는 데 착안하고 이식한 시도는 놀라운 일이다. 일본, 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들도 포기한 국가가 아프리카다. 그만큼 벼가 자라기에는 기후와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하지만 통일벼는 달랐다. 시작부터 통일벼가 아프리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2019년 12월은 통일벼를 활용한 새 품종이 아프리카에 첫 등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농진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의 다수성 벼 개발 과제로 아프리카 벼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새 품종을 말라위와 말리 두 나라에 아프리카 최초로 등록했다.
농촌진흥청과 통일벼는 밀접한 인연이 있다. 농진청 60년사에서 통일벼의 존재는 상당하다. 그만큼 통일벼는 지금의 국산 벼 품종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지금 시선으로 본다면 당시 통일벼는 단점이 많았던 품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벼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높아졌고, 이후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찬사 받고도 남을 일이다.
농진청은 지난 2022년 출범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60여년 간 농진청은 농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농업'으로 농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 앞서가는 벼 품종 및 다양한 작물의 재배법을 인류를 위해 사용해 평화세계 실현의 모범국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 식민지와 분단, 동"상잔의 폐허 위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위상을 지닌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우뚝 서는 그날을 그려본다.
사실 아직도 지구촌 곳곳 민초들의 삶은 하루하루 버겁기 그지없다. 민생의 어려움 해결에 정치의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오죽하면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이식위천(以食爲天), 백성은 먹고사는 일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겠는가.
SDG뉴스
< Copyright SDG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