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수수께끼를 풀다(찰스 킹 지음, 교양인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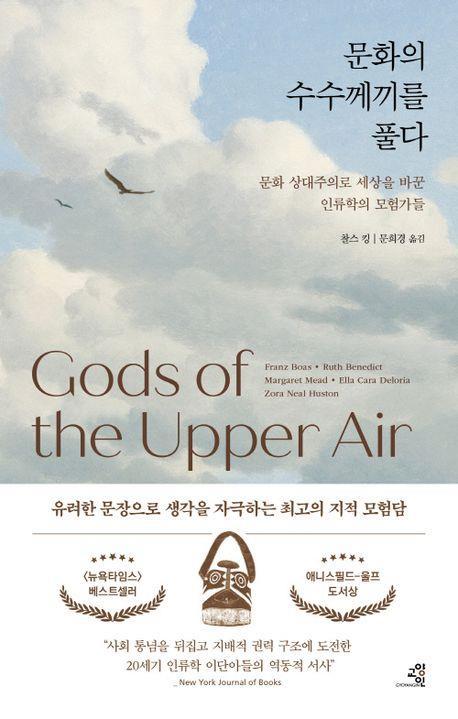 |
“인종, 민족, 성별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즉 백인은 흑인보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진리이자 상식으로 통하던 주장이다. 당시는 이민 제한, 인종 분리, 우생학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신간 ‘문화의 수수께끼를 풀다’는 미국 인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프란츠 보아스와 그의 제자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집한 사례를 통해 인종주의의 허구를 깨고,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개념을 창시하게 된 과정을 엮은 ‘집단 전기’다.
책 속에는 보아스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이자 문화적 상대성의 개념을 널리 알린, 우리에게는 ‘국화와 칼’로 더욱 유명한 루스 베네딕트를 비롯해 남녀의 성 역할이 자연적이거나 고정된 게 아니라 문화적 창조물 혹은 학습된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힌 마거릿 미드, 북미 원주민 출신으로 사라져가는 원주민(인디언) 전통을 보존하는 데 힘썼던 엘라 케러 델로리아 등이 진행한 생생하고 꼼꼼한 취재, 연구, 고증이 두루 담겨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인종주의와 같은 비과학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 분투 했는지 보여준다.
저자들이 겪었던 인종주의, 성차별 등에 대한 기록은 슬프고 처참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모두 여성이면서 유색 인종이거나 성 소수자, 신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당대 미국 사회에서는 ‘이탈자’ ‘아웃 사이더’ 혹은 ‘미친 여자’ 등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능력과 잠재력은 우생학에 의해 결정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합리한 처우와 과정을 경험했다. 이들의 사상은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위험하고 급진적인 사상’으로 여겨졌고, 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FBI의 감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인류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둘러싼 장벽과 편견을 돌파할 ‘해방의 사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보아스 학파의 ‘문화적 상대성’은 당대 가장 치열하게 ‘도덕 전쟁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의 강렬한 서사이면서 동시에 암울한 시대에 길을 밝혀주는 '공감과 희망의 과학'이었다. 또 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미국과 유럽을 지배한 과학적 인종주의와 사회진화론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면서 문화인류학을 이끈 지적 거인들의 삶과 사상이 전기 형태로 생생하게 펼쳐져 소설을 읽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2만8000원.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