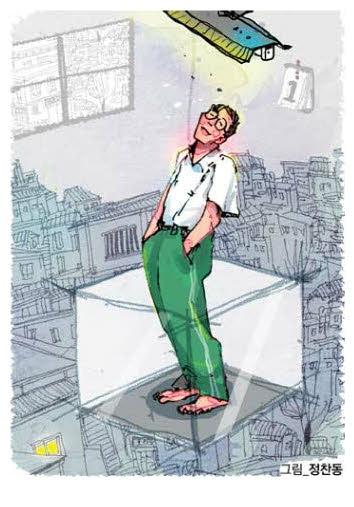 |
날씨가 쌀쌀해졌다. 유난히 더웠던 터라 올해의 쌀쌀함은 왠지 극적이다. 아침 운동을 나가는 길에 만난 선득한 공기가 반갑다. 겨울은 냄새로 먼저 온다. 코끝이 찡해지는 매운 냄새, 그 사이로 스며드는 낙엽 냄새, 어디선가 솔솔 나는 연기… 그리고 아랫목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방 냄새.
어릴 때 겨울이면 방에 메주가 걸려 있었다. 때로 퀴퀴하고 때로 구수한 곰팡이 발효 냄새가 몸에 붙어 다녔다. 청국장도 아랫목에서 익어갔고 낡은 전기밥솥엔 땡감이 담겨 있었다. 보온 버튼을 누르고 넣어놓으면 땡감의 떫은맛이 사라지고 달달해졌다. 사각거리는 땡감은 밥솥에서 꺼낸 뜨끈뜨끈한 것이라 단맛이 더 진했다. 이 땡감도 요즘엔 다 개량되어서 보기 힘들다. 붉은색 꽃무늬 담요를 허벅지까지 끌어올리고 고구마와 동치미를 먹는 맛은 얼마나 좋았던가.
어릴 때는 '방'이 붙은 단어가 유독 많았다. 점방, 만화방, 복덕방, 다방, 책방, 화방, 시계방, 구둣방, 담배방, 하꼬방, 셋방, 달방 등등.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칭하는 게 가겟방일 것이다. 나는 이런 명칭 문화가 한옥이나 단층 가옥이 건축의 중심이었던 시대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집의 한 귀퉁이를 떼어내 생계의 방편으로 삼았던 전통의 산물이 아닐까. 조선시대 과부들은 남편이 일찍 죽어 생계가 어려워지면 사랑채에서 술을 파는 술방을 운영했다.
오늘날의 방은 막힌 공간들의 전유물이다. 찜질방, 노래방, 피시방 등 휴식과 오락 공간부터 각종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들까지 대부분 막히고 차단된 공간들이다. 그에 비해 과거의 방들은 소통과 들락거림의 공간이었다. 사랑방과 사랑채는 친교와 접대의 공간이었으며, 문간방은 나그네의 허름한 숙소를 대신했다. 동네가 온갖 방으로 꽉 차 있던 시절에는 동네 전체가 하나의 집 같았다. 그래서 동네에서 놀 때는 방에서 방으로 옮겨다니는 느낌이었던 게 아닐까.
내친김에 '방'의 어원을 더듬어봤다. 사전을 보면 방(房)자는 지게 호(戶)자와 모 방(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방(方)자는 소가 끄는 쟁기를 그린 것으로 '방향'이나 '네모'라는 뜻을 갖고 있다. 방(房)자에 쓰인 방(方)은 발음 역할을 하면서도 '네모'라는 뜻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보통의 거주공간은 네모난 구조로 지어져 있다. 그러니 방(房)자는 네모난 방(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戶)라는 의미에서 '방'을 뜻하게 된 것이다. 방(房)자는 갑골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춘추전국시대의 금문(金文)에 처음 등장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그림에 가까운 문자다. 살펴보면 호(戶)는 출입구라기보다는 지붕에 더 가까워 보인다. 금문의 방(房)은 문(門)처럼 생긴 상형문자가 같이 결합된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붕 아래의 문을 지나 들어가는 네 개의 모서리를 갖춘 빈 공간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인간이 태초에 비를 피한 것은 동굴이었으니 그때까지는 방이 존재하지 않았다. 움막을 쳐서 살았던 석기시대까지도 아직 방이 등장하지 않았다. 방은 집의 기능이 나뉘면서 생겨난 분할의 산물이다. 농사를 짓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먹거리가 확보되는 시점에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식량을 쟁여두고 먹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인구가 늘면서 업무가 나뉘었고 집안의 식솔들을 거느릴 가장이 생겨났다. 그때서야 집은 커지게 되었고, 공간을 분할하여 방이 생겨났다. 안주인이 있는 곳은 안방, 바깥양반이 쓰는 곳은 사랑방, 음식을 만드는 곳은 주방,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은 다락방이 되었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다락방에 얽힌 기억도 상당할 것이다. 어릴 때 내게 다락방은 냄새로 기억된다. 평소에 열지 않는 문이기 때문에 온갖 잡동사니가 뒤엉켜서 쥐들이 지나다니고 먼지가 풀썩이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그 어두운 공간은 특유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상하게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가 좋아서 식구들이 없는 날이면 다락방에 들어가 한참이나 앉아 있다가 나오곤 했다.
이제 그 많던 방들이 사라지고 없거나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도 기억 속에서 그 방들은 여전히 맹렬하게 살아서 숨 쉬고 있다. 점방 앞의 호빵기계에서 막 꺼낸 호빵처럼.
 |
[강성민 글항아리 대표]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