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보다 '안정추구' 기업에 투자금이 더 몰리는 현상
거래소 상장 시스템 '기술보다 매출'로 보수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정신' 멸종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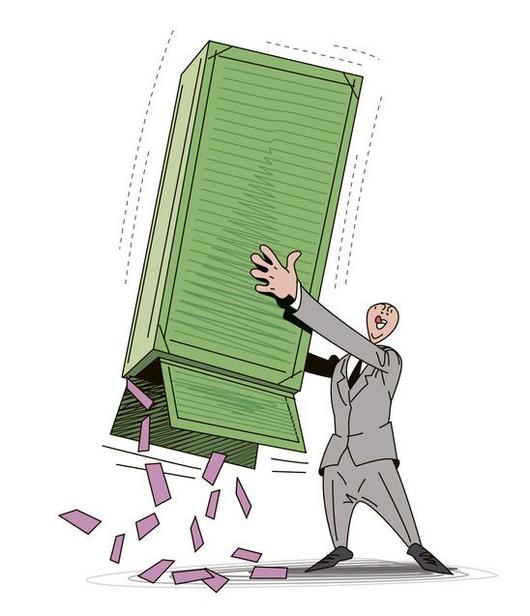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년 넘게 국내 스타트업의 멘토 역할을 해 온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 S사 대표는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 창업자 정신을 키우고 기업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만한 동력이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스타트업 업계 인사말…"돈 얼마 남았냐, 몇 개월 버틸 수 있냐"
S사 대표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인사말이 될 정도로 업계가 힘들다"며 "정부 지원 모태펀드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줄이 끊기니 스타트업들이 말라 죽어간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내 벤처투자·펀드결성 세부현황을 보면 2021년 139억달러에 달했던 벤처투자금액은 2023년 84억달러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신규투자현황을 보면 2021년 15조9371억원, 2022년 12조4706억원, 2023년 10조9133억원으로 지속 감소세다.
그는 "그나마 있는 투자금이 성장 기업으로 가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현재 투자환경에선 투자자들이 100억원 매출에 10억원 적자인 기업보다 10억원 매출에 적자 없는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구는 기업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자들이 더 좋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실속 없이 외형만 키운 기업들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반발로 투자자들이 강한 재무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밸런싱이 잘돼야 하는데 지금은 좀 과도하게 투자자들이 재무적 건전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나서 글로벌 진출을 하자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게 되면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 업계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가 오히려 닫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미래산업의 방향성 가를 K-스타트업…정책방향은 기술보다 매출로 '어긋난 초점'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절과는 달리 시장의 절대적인 자금이 줄어들면서 벤처 투자에서 '스트라이크 존(strike zone)'이 좁아졌다. 한국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에 자금이 모여야 하지만, 최근 정책 방향은 그렇지 못하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DSC인베스트먼트 대표)은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존이 과거에는 1㎡였다면 이제는 10㎠로 바뀐 것"이라며 "이제는 내수만 볼 수가 없고 초기 스타트업도 다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놓고 시작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밑바닥부터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에 돈이 가도록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장 시스템이 기술이 아닌 매출과 이익이 나는 쪽에 자꾸 포커스를 두고 이끌어 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래 기술이 아닌 지금 돈 잘 버는 매출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을 시켜주니까 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그쪽만 볼 수밖에 없다"며 "벤처는 열 개 투자해서 한두 개 성공하는 것이다. 상장도 10개 상장하면 5개 정도는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소액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만 기업을 바라보면 도전적인 기업, 미래 기업으로 돈이 흐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래 실적 추정 근거 '현미경 심사'에…기술 벤처들 줄줄이 상장 좌절
최근 몇 년간 신라젠, 파두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현미경 심사가 강화됐고, 자본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내 스타트업·벤처 시장이 지나치게 보수화됐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바이오벤처들이 높아진 허들을 넘지 못한 채 상장을 잇달아 철회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예비 상장사의 미래 실적 추정 근거를 놓고 까다로운 검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올해 코루파마, 노르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등의 기업들이 상장 예비 심사를 줄줄이 자진 철회했다.
코스닥 시장 30년 경력으로 '코스닥통'이라 불리는 정운수 한국거래소 전 부이사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매출이나 이익보다 성장 가능성, 글로벌 경쟁력 등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활기 없는 죽은 경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는 "바이오 분야의 경우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라며 "매출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트업 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가 발표한 '2023 한국 스타트업 투자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스타트업 수는 총 146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규 설립 건수는 95개로, 2022년 322개 대비 70.5% 급감했다.
누적 투자 유치 기준 수백억 원을 조달한 스타트업들도 무너졌다. 옐로디지털마케팅과 옐로오투오그룹은 각각 511억원,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2023년 10월 폐업했다. 시리즈C까지 진행, 120억원을 투자 유치한 스크린야구 개발업체 클라우드게이트와 102억원을 투자 유치한 소상공인 매출 정산 플랫폼 더체크 역시 폐업했다.
시드 단계에서 23억원을 투자 유치해 기대를 모았던 테일버스도 문을 닫았다. 이 외에도 화훼 시장 새벽 배송 서비스 '오늘의꽃',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의 첫 투자 기업인 '남의집'도 폐업했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3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5.4%보다 11.6%포인트 낮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