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욱의 백년사진 No. 65
이번 주 백년사진이 고른 사진은 1924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 2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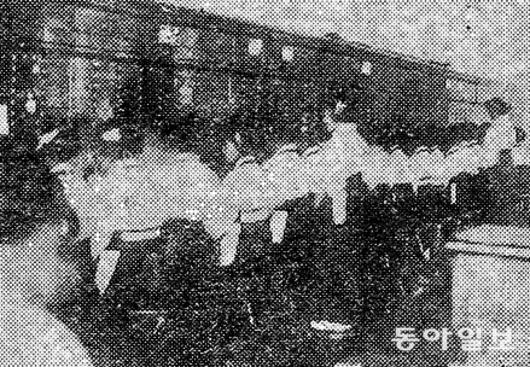 |
1924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좁은 사무실 벽에 빼곡하게 나열된 전화 교환기 앞에 소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뒤로 감독자들이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빨간 불빛이 들어오면 전화 연결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원하는 번호로 재빨리 연결시키는 게 소녀들의 역할입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통을 떼어 귀를 대고 있으면 다같이 “하이 하이”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하이 하이”소리는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 사람 중에도 가장 자랑이 많고 청춘의 피가 끓는 꽃같은 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조선 사람의 전화 가입자와 가장 인연이 깊은 광화문 전화분국에 가면, 눈빛같이 흰 적삼에 자줏빛 치마를 입은 묘령의 여자가 전부 수화기를 머리에 기우고 반짝반짝 일어나는 붉은 불빛을 쫓아 번개같이 날쌔게 부르는 번호에 줄을 꽂아주어 전화를 접속시킨다. 한 사람 앞에 수 많은 번호를 맡아 가지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접속시켜도 뒤를 이어 불러 온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떤 가입자든지 전화를 걸면 그 전화에 불이 켜지고 교환수는 그 불을 보고 몇 번인가 물어 저 편에서 부른 번호에 꽂아 주어 말을 하게 하고 만일 부르는 번호가 말하는 중이면, “하나시주(통화 중)”하고 대답한다. 더욱 서울 안에서도 구역을 따라 전화번호 책에 쓰인 대로 용산이면 용산을 불러 대어 주며 시골로 전화를 걸려면 먼저 시외를 불러 가지고 그 시골의 번호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 다른 사진을 찾아 보았습니다. 비슷한 모습의 교환실 모습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50년이 지난 사진입니다.
 |
서울시외전화국 교환실 모습(1970년대)/동아일보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 전화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온 것은 1902년 3월 20일 대한제국 통신원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성과 인천 사이에 전화를 임시로 설치하면서부터라고 검색이 됩니다. 이 시절에는 전화 교환수를 통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거나 핸들을 돌리면 교환수가 나와 원하는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도 군대에서는 교환병을 통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위 사진은 그 교환수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1971년이 되자 전화 교환원 없이 전화를 건 사람이 직접 다이얼을 돌려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자동식 전화가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전화 교환원을 거치는 수동식 전화기는 ‘흑통’, 교환원 없이 가입자가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자동식 전화기를 ‘백통’이라 불렀습니다. 백통은 당시 신청을 해도 한두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귀했으며, 가격이 비싸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1987년 전국 자동 교환망이 완성되면서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렸고, 전화 교환원 없이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5세 소녀들 생계 위해 전화 교환수로 취직
초기 전화 교환원은 대부분 남성이었으나 1920년대 이후로 여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4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젊은 여성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화 교환수를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편국에서 전화 교환수로 조선 여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학력은 보통학교 졸업 정도면 충분했으며, 일본어 가능자가 우대되었다. 처음 입사 후 3개월간 견습 기간 동안 일당 51전을 받았고, 이후에는 60전 이상과 근면 수당을 지급받았다. 근무 시간은 45분 일하고 1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다. 당시 3명의 교환수가 있었는데, 모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일을 잘해 앞으로는 여성만 채용하기로 했다. 나이는 15, 16세로 야근을 못하게 하는 부모들 때문에 야근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1931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따르면 “서울의 전화 가입자는 3,140명이고 교환수가 352명.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두 시간이 가장 바쁜데 한 교환수가 한 시간에 약 210회씩 응하고 있다. 교환수가 늦게 대답한다고 해서 갖은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어 직업으로서는 아주 힘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58년 12월 11일자 기사도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1분 동안 많을 때는 60통의 통화를 교환해야 하는데 좋은 청각과 고운 음성과 재빠른 솜씨가 필요하다. 이런 솜씨를 습득하는 길은 중앙전화국에 설치된 교환양성소에서 3개월간 무료로 수속을 받고 다시 시험을 치른 다음 증명서를 받으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 국제화에 맞춰 외국어 전문 전화교환수 출현…이제는 사라진 직업
1980년대에는 국제화시대에 맞춰 국제전화 교환수가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21일자 기사 “다이얼「102」「117」을 돌리세요”를 보면, 전 세계 157개국과 하루 평균 1만 7천건(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4만 건)의 국제전화통화를 4백 명 가량의 국제전화교환수들이 8시간씩 3교대로 접속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또 “국제전화교환수들은 선발시험에 통과된 후 3개월간의 영어 일어등 어학교육을 받고도 항상 개방돼있는 어학실습실이나 VTR교재등을 이용하여 외국어공부를 계속한다。 또 영어와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아랍」어등 제2외국어에대한 리포트를 매주 2페이지씩 제출한다。 이처럼 어학훈련을 받아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대방 이야기를 듣게되기까지는 1년남짓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백 명의 교환수 중 남성은 3명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1983년 8월부터는 미국 등 일부지역에는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으로 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화 교환원의 직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자동화되고 사라졌지만, 전화 교환원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100년 전 서울의 전화 가입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던 소녀 전화교환수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전화교환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구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족과 풍경을 멋지게 찍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진이 흔해진 시대에, 우리 사진의 원형을 찾아가 봅니다. 사진기자가 100년 전 신문에 실렸던 흑백사진을 매주 한 장씩 골라 소개하는데 여기에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사진의 맥락이 더 분명해질 거 같습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