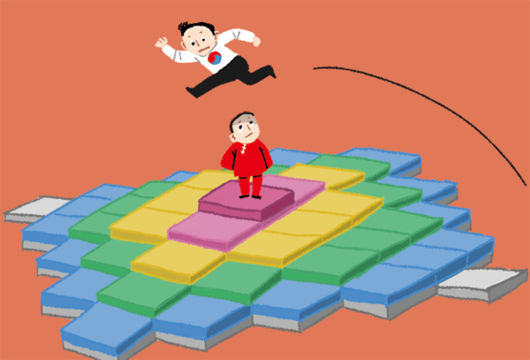 |
일러스트=김성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몸에 걸치는 옷은 사람에게 중요한 부속(附屬)이다. 신체를 가리거나 보호하고, 또는 치장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 대표적 한자말은 의복(衣服)이다. 그러나 뒤 글자 ‘복’의 본래 꼴은 평범한 옷과 거리가 멀다. 강제로 사람을 꿇어앉히거나, 적어도 인체에 힘을 가해 제압하는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먼저 얻는 뜻은 무력을 사용해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다. 거기서 우선 나온 단어가 복종(服從)이요, 항복(降服)이다.
전쟁이라는 형식을 통해 남을 누르는 행위가 정복(征服)이다. 상대의 위세에 눌려 스스로 무릎 꿇으면 굴복(屈服)이다. “하라면 하지 웬 말이 많아”라고 다그치며 위아래를 내세우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성어 상명하복(上命下服)이다.
맡은 임무에 충실히 따르는 일이 복무(服務), 마음으로 상대를 좇으면 심복(心服), 드러난 결과를 받아들이면 승복(承服)이다. 아예 남에게 붙어버린다면 복속(服屬)이다. 그런 경우가 싫어서 이기려고 덤비면 극복(克服)이다.
사람 몸에 따라붙는 ‘옷’의 새김은 나중에 얻었다. 그런 의미 맥락에서 중국은 일찌감치 오복(五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자신을 세상 중심에 두고 동심원을 그려 권력의 상하(上下), 거리에 따른 친소(親疏) 관계를 설정했다. 동심원의 가장 안쪽 동그라미에 속해야 최상위에 속한다. 거리가 멀수록 위계(位階) 또한 추락한다. ‘중심과 변두리’라는 중화주의 발상이 영근 사상적 토대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이에게는 복종과 굴복, 복속을 강요하는 일이 흔했다.
2000년을 넘게 위세를 떨친 중국의 중화주의는 우리에게 큰 문명적 숙제다. 힘이 강해지면 늘 이웃의 여럿에게 서슴없이 강요한 질서다. 이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선거판에서 승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가볍게 여기며 다룰 일이 아니다.
[유광종 종로문화재단대표]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