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했던 1년 전과 비교, 기저효과
노인 단순근로, 일자리 증가 3분의 2 차지
30~40대 한파 여전,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
 |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5만2000명 증가했다.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 3월(31만4000명) 이후 2개월째 이어졌다.
실업률도 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15~64세 고용률은 66.2%로 1.1%포인트 올랐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생산ㆍ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또 지난해 4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나타나는 통계 착시) 등이 반영돼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홍남기 “고용 회복 뚜렷”, 통계는 다른 얘기
이날 통계 발표 직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수출ㆍ내수 회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용 회복 흐름도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전체 취업자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속사정을 뜯어보면 섣불리 고용 회복을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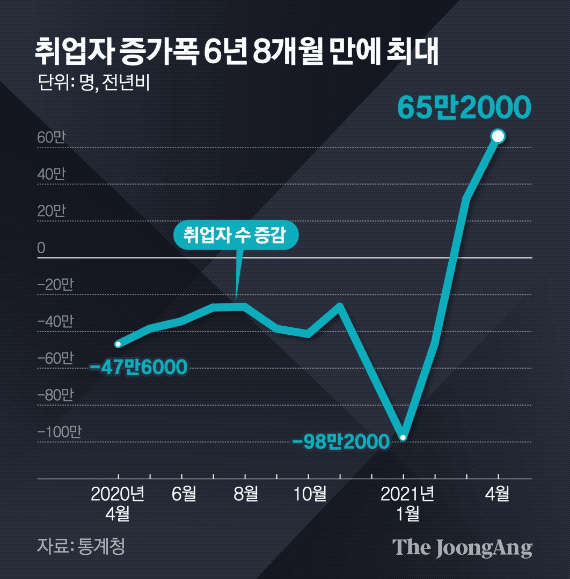 |
취업자증가폭.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단 기저효과가 컸다. 취업자 수가 65만 명 넘게 늘어나긴 했지만 비교 대상이 된 지난해 4월 감소폭이 47만6000명에 달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일자리도 큰 몫을 했다. 산업별로 나눠보면 재정 일자리 비중이 큰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22만4000명)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16.1%)을 차지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월 4만4000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그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큰(12.3%) 도ㆍ소매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18만2000개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보다 더한 고용 한파를 겪는 중이다.
━
60세 이상 단순 노무, 취업자 증가 대부분 차지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보면 온도 차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6만9000명 급증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13만2000명), 50대(11만3000명)를 뛰어넘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분 3분의 2가량을 고령층이 담당했다는 의미다. 30대(-9만8000명), 40대(-1만2000명) 일자리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47만6000명)가 가장 많이 늘어, 역시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4월 고용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별ㆍ연령대별ㆍ직업별 통계를 종합하면 정부가 자신한 “고용 회복”의 불편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랏돈으로 월급을 충당하는 노인 단순 일자리가 지난달 고용 회복을 이끌었다. 정작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줄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홍 총리대행은 “30~40대 고용과 관련해서는 절대 인구 감소와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 증감 효과를 덜어낸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 통계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지난달 전 연령대 고용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코로나19발(發) 고용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과 비교한 수치일 뿐이다.
━
고령층 뺀 나머지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률 악화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가 문제”라며 “코로나19 위기가 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률은 2019년과 비교해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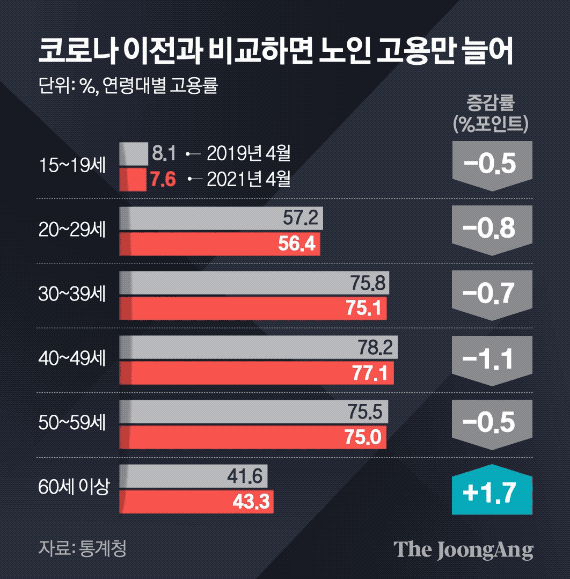 |
코로나 이전 비교 노인고용만 늘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년 전인 2019년 4월과 지난달 고용률을 비교하면 60세 이상(41.6→43.3%)만 올랐을 뿐 15~19세(8.1→7.6%), 20대(57.2→56.4%), 30대(75.8→75.1%), 40대(78.2→77.1%), 50대(75.5→75%) 모두 내려갔다.
김 교수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물론 청ㆍ장년층 모두 고용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세대처럼 아예 고용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장기 실업 상태에 머무는 코로나 세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