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응백 연작소설 ‘남중’ / 6·25전쟁·분단시대를 살아온 / 어머니·아버지 한평생 삶 담아 / 작가 자신의 뿌리·정체성 탐사 / “‘남중’은 인생의 순간적인 황홀 / 누구라도 그 극점 잊지못할것”
 |
“애비야, 시집가면 된다 카던데.”
팔순을 넘긴 노모가 어느 날 시집을 가겠다고 아들에게 말한다. 치매가 아니다. 정신이 명징한 상태에서 60여년 품어 온 한을 토설한 경우다. 아들인 문학평론가 하응백(58)은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 어머니 김벽선(1929~2017) 여사를 모시고 구청에 가서 이미 오래전에 전사한 망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데 성공했다. 어머니는 늘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는데 아들은 그 사연을 이렇게 압축한다.
“6·25전쟁이 한창일 때 어머니는 시집을 갔다. 신혼 사흘 만에 군에 간 남편은 전사했다. 그 후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지나가던 영감탱이에게 몸을 허락해 낳은 아이가 나다. 그 영감탱이가 나의 아버지다. 어머니와 영감탱이가 같이 산 날은 일생을 다 합쳐봐야 채 몇 달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인생이 억울하지.”
혼인 사흘 만에 남편을 나라에 빼앗기고 그 남편이 죽음에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7년 동안 시집살이를 한 여인이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법적인 처녀로 살아왔으니 그 억울함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들은 어머니의 옛 시댁을 찾아가 증인들을 찾고 서류를 확보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어머니는 첫 유족연금을 받고 아들에게 말한다. “이제 남편 돈으로 살아보겠네. 60년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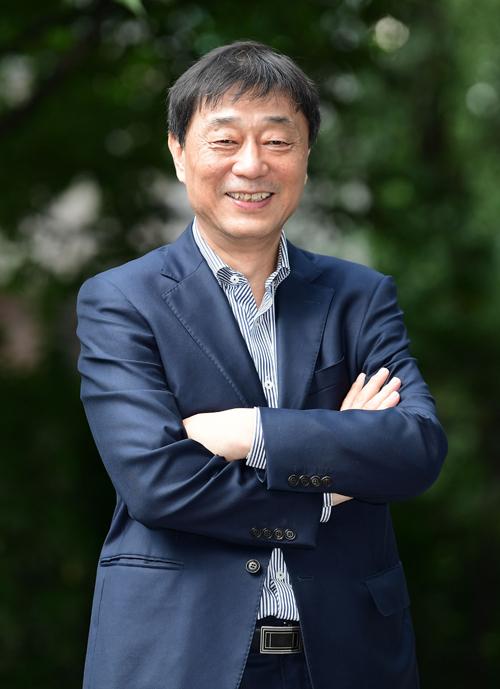 |
연작 형태로 자전소설을 펴낸 문학평론가 하응백. 그는 “자전소설이건 연작소설이건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문 기자 |
필부필녀 장삼이사의 한 많고 눈물 많은 사연들이야 어찌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만은 누군가 글로 기록하면 그 내용은 새로운 아우라를 발산하게 된다. 아들 하응백은 자신이 세상에 나오게 된 뿌리를 더듬으며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의 한평생을 행장(行狀) 형식으로 기록하고, 문학평론가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덧붙여 연작소설 ‘남중’(휴먼앤북스)에 담아냈다.
‘김벽선 여사 한평생’에 이어 ‘하 영감의 신나는 한평생’에는 아버지의 삶을 담았다. 신의주에서 목재상을 하며 세 딸을 둔 가장으로 살다가, 주막집에서 만주로 돈 벌러 간 남편을 기다리던 여자를 취해 남쪽으로 내려온 이가 아버지다. 그이는 대구에 정착해 다시 3녀1남을 낳고 살면서 ‘서른 살 전쟁 과부’인 김벽선 여사를 서문시장에서 만나 육십이 다 되어 아들을 낳았다. 김 여사는 아들 하응백을 아버지 호적에 올려놓았고,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담임이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왜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고 동거인이냐고 묻는 바람에 상처를 받았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던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그 콤플렉스를 극복할 것인가 궁리했다. 그 아이가 상처를 극복하는 매개가 바로 문학이었다. 세계와 자신을 이어주며 정당성과 존재가치를 확보해주는 밧줄이 문학이었고, 그것은 그가 희구한 ‘남중(南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였다.
남중이란 태양이 자오선의 가장 위쪽 위치한 상태, 누군가의 머리 위로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를 일컫는다. 하응백은 “모든 개개인에게 ‘남중’ 같은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극점이 반드시 있고, 그런 생명성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을 관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홀한가”라고 말한다. 그는 군대시절 허름한 간이변소 뚜껑이 돌풍에 날아가면서 맞았던 “태양과 하늘과 내 입과 내 몸의 내장과 항문이 지구의 구덩이와 일직선으로 놓이는 그 통쾌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하응백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와 6·25전쟁과 조국분단의 시대를 다 겪으면서도 남북을 주유하며” 살다가 “평생 호호탕탕 유유자적 사신 탓으로 걸리적거리는 직함 하나 애써 구하지 않아 영감으로 호칭”된 하창서(1899∼1979)의 행장을 적은 이후, 3부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야합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도도한 자신감”인 그 ‘남중’을 향해 다가간다. 황순원 소설가, 박정만 시인의 비사를 꺼내고 그가 박사학위 논문 대상으로 삼았던 월북 문인, ‘주체의 재건’에 심혈을 기울였던 김남천에게 자신의 ‘주체’를 투사하기도 한다. 문학인 블랙리스트 재판에 특검의 증인으로 나섰던 대목도 흥미로운 기록이다.
하응백은 문학을 하는 이가 글쓰기를 통해 맞이하는 황홀의 극점, 그 ‘남중’을 제목으로 삼은 소설 집필 계획을 대학 1학년 때 세운 이후 40여년 만에 자오선의 가장 높은 지점에 당도한 셈이다. 그는 ‘1인칭 입체소설’이라고 자평하는 이번 소설의 독자 반응을 보고 그동안 확보한 국악 지식을 활용해 예술가 역사소설도 써볼 생각이다.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