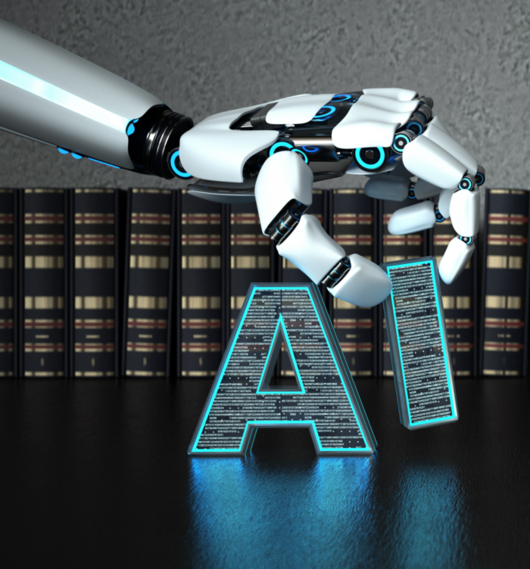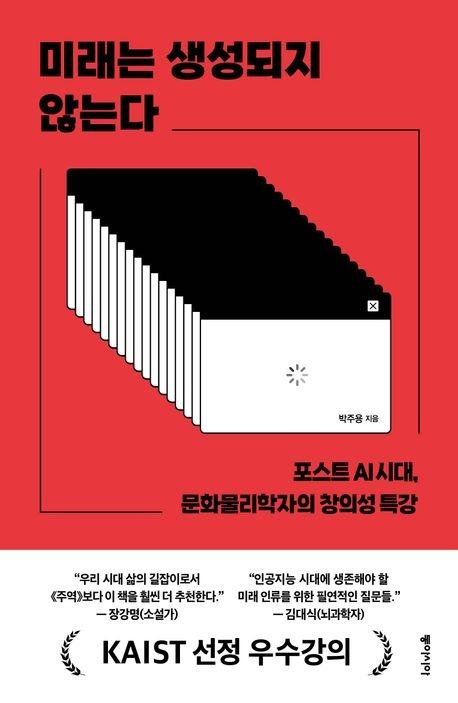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 / 박주용 지음 / 동아시아 펴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주와 음악, 엔트로피와 창의성, 인공지능(AI)과 반 고흐. 과학과 문화의 관계를 관찰하고 과학으로 문화를, 문화로 과학을 설명하는 저자의 명강의가 책으로 나왔다.
저자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자신을 문화물리학자로 칭한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일견 모순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는 “문화란 인류의 삶의 방식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의 총체이므로 물리학도 응당 문화에 포함된다”고, 또 “물리학이란 모든 물체들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이므로 문학도 당연히 그것의 탐구 대상”이라고 말한다.
이런 정의는 예술도 한낱 물체에 불과하다거나, 과학은 추상의 결정체인 ‘아름다움’에 가닿을 수 없다고 하는 냉소가 아니다. ‘무성한 나무 잎사귀에 새겨진 무늬 안에도 과학적 질서가 숨어있다’는 깨달음이다. 저자는 과학과 문화의 진정한 연결고리는 ‘사람’이며,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 미래를 열어왔다고 믿는다. 마치 오늘날 생성형 AI가 소설도, 음악도, 그림도 무엇이든 생성해내며 인간 창의성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듯한 세상이지만, 엄연히 미래는 우리 존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러나 진화론이 인류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다윈조차도 인간이 생존경쟁뿐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를 배우며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고 봤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인간에게는 자연환경의 진화적 압박에 대응할 힘이 있다”며 “우리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지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며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