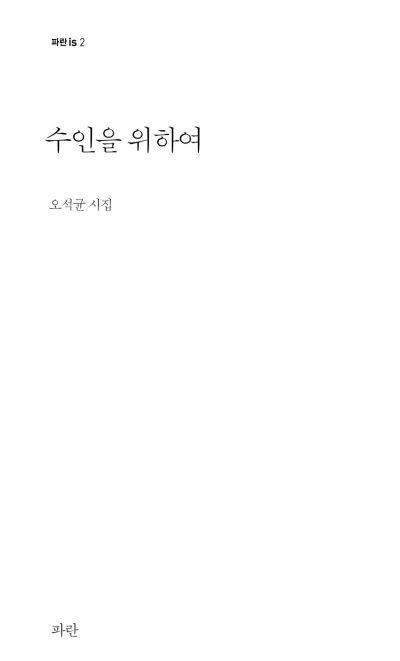 |
◆수인을 위하여=오석균 시인의 세 번째 신작 시집으로 53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번 시집은 순정하다. 전혀 꾸밈이 없으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일부러 애쓰지도 않는다. 시인은 다만 담담하게 적을 뿐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낙엽이 지면 엎드려 방을 닦는다/꽃 진 날도 그랬다”와 같은 무심한 듯하나 지극한 시를 이룬다. 이 곡진함에 말을 덧대는 일은 아무래도 어리석을 따름이다. 오석균 시인이 적은 대로(“그냥 걸었다/신이 내게로 왔던 길을 찾아”) 우리는 “그냥” 읽을 도리밖에 없다. 그것이 ‘시가 왔던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기에 말이다.
 |
◆천 마리의 양들이 구름으로 몰려온다면=박춘희 시인의 새 시집. “나무-인간이라는 박춘희 시의 상징은 어디에서고 뿌리내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가리킨다. 도시의 “보도블록 틈새”마다 “이 악물고 버티는/질긴 나이롱 실/같은”(잡풀) 사람들에 대한 주체의 시선은 그러므로 애틋하다. 예컨대 어느 도시 귀퉁이 재래시장 한편의 여관방에서 “배를 곯던” 만삭의 여인이 아껴 걸어 둔 코다리에 구더기가 들끓는 기막힌 상황을 제시한 다음, 주체가 마지막에 건네는 말은 곰실곰실한 벌레들의 움직임이 “날개의 은유”라는 것이다(명태 보살). 이것이 여인의 회상을 전해들은 주체가 그녀가 다하지 않은 말들을 길어 올린 것임을 추론하기란 어렵지 않다.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미물들이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음은 물론이다. 박춘희 시의 주체도 마찬가지다.”(문학평론가 김영범의 해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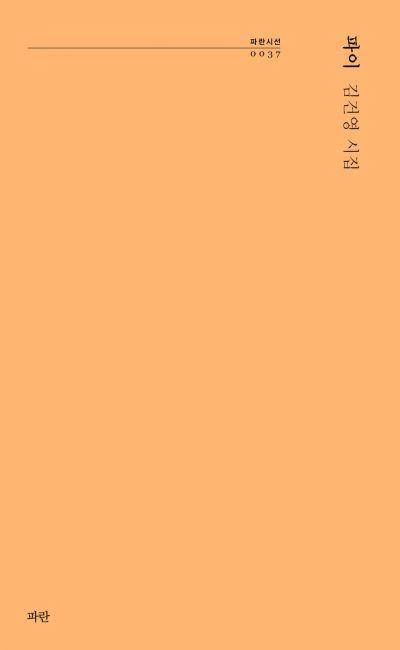 |
◆파이=김건영 시인의 새 시집. “이토록 웃기고도 슬픈 시가 있었나? 웃음과 슬픔이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가 하나의 무대 위에 펼쳐질 때, 그건 자칫 우스꽝스러운 슬픔이거나 슬퍼지다 만 웃음이 되기 십상이다. 웃기지 않는 코미디와 슬프지 않은 신파극을 상상해 보라. 웃음과 슬픔을 하나로 섞는 일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슬픔은 스펀지처럼 스며야 하고 웃음은 스프링처럼 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웬만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그 리듬의 차이를 한 몸에 담기는 쉽지 않다. 말로써 그것을 수행해야만 한다면 더욱 그렇다. 김건영 시인의 말 부리는 재주는 최상급이다. 말로써 사람들을 웃기거나 울리는 재주가 없는 자에게 그의 시적 언어는 경이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의 언어는 독보적이다. 그렇다고 견줄 데가 전혀 없지는 않다. 물론 이건 그의 시가 어떤 계보에 귀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그의 시를 보면서 기시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그가 언어를 다루는 방식이 특정 장르의 어떤 작품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문학평론가 장철환의 해설 중에서)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