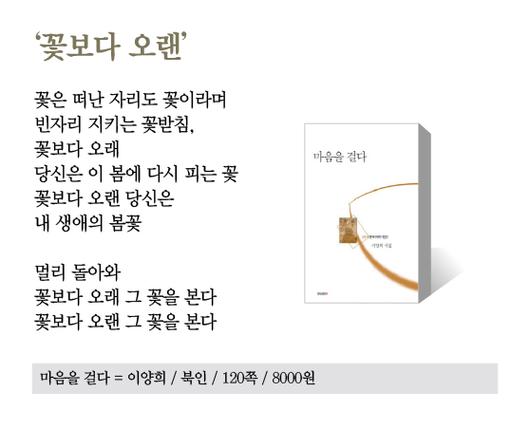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9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양희(1958~ ) 시인의 네 번째 시집 '마음을 걸다'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물들에 말을 걸고, 그 말이 꽃과 꽃받침이 되고, 말들이 익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농익어 떨어진 빈자리에 다시 새로운 말들을 들여놓은 걸 받아 적었다. 시인은 "만물의 몸을 뚫고 나온 말/ 빛과 소리와 그늘과 침묵의 말"('빌린 말')을 받아들여 시를 쓰고, 자연과 교감하며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감나무의 말이 붉게 익었다
떨어져나간 풋말과 풋말들 사이
놓쳐버린 것도 섞여 있었을까
감나무는 놓아버린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잘 익은 말들을
허리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매달고
마침내 한 감나무의 가을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그대로 며칠이라도 붙잡아두고 싶은지
감나무는 파란 하늘 아래 그림같이 서 있지만
풋말들 사라진 그늘 아래
너무 익은 말들이, 너무 무거워진 말들이
의미없이 널브러져 죽은 자리에
평생을 기다린 말들의 시간이 검붉게 엉켜 있다
- '감나무의 말이 붉게 익었다 1' 전문
사물들은 시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다. 어린 매화나무는 "첫 꽃잎 열어"('첫말') 향기로 첫말을 걸고, 한여름 매미들은 "울음의 말"('매미 소리')을 쏟아내고, "걸음을 익히는 첫길"('아이와 새')의 아이 신발 속에서는 아기 새의 말소리 짹짹 들린다. 사물들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시인도 사물과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 "말이 이끄는 대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나를 여기로 데리고"('아득한 그림') 오기도 하고, 심지어 누군가와 헤어져 "움푹 파인 시든 자리에/ 말을 뚫고 나온 눈물 자국"('빈자리')이 쓸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시 '감나무의 말이 붉게 익었다 1'에서 꽃 진 자리에 열린 감은 "감나무의 말"이다. 겨우내 나무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세상에 말을 걸고 있는 것. 시인은 붉게 익은 "감나무의 말"보다 "떨어져나간 풋말"과 "놓쳐버린" 풋말들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 있다. 건강하게 성장한 자식보다 아프거나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자식이 더 눈에 밟히는 부모의 심정이 짙게 묻어난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런 마음을 오래 붙잡아두지 않는다. 감나무에 잘 익은 말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주렁주렁 매달"려 "한 감나무의 가을 이야기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 같은 풍경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처럼 그윽한 풍경은 풋말들의 희생으로 이룬 것이고, "평생을 기다린 말들" 역시 "의미없이 널브러져 죽"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떨어지거나 놓치거나 주렁주렁 달고 있거나 이런 시적 정황을 통해 시인은 끊임없이 햇빛과 그늘, 상승과 하강의 삶을 교직하면서 시의 집을 짓는다.
늙은 살구나무는 참 오지랖도 넓지요
등허리가 휘어지게 꽃등을 달고도
돌아앉은 창으로 손가락 뻗어
기어이 새 꽃등을 밝히려고 드니
오래 어둡던 나의 창 앞에도
살구꽃등 하나가 켜지겠어요
머잖아 환한 등쌀에 못 이겨
어둠에 젖은 창이 조금씩 열리겠어요
마음이 먼저 꽃등을 맞이하겠죠
숨어 있던 미소가 피어오를 거예요
꽃등의 물결이 순하게도 밀려들겠죠
오지랖 넓은 살구나무 같은
참 환한 살구꽃등 같은
오래도록 당신이 떠오를 거예요
- '살구나무와 창' 전문
시인은 '자서'에서 "나이 들면 경주 남산 밑에 집 짓고 살자 하던 말이 씨가" 되어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산 지 몇 해가 흘렀다면서 "이번 시집에 실린 대부분의 시는 남산 밑에서 만들었으니, 말이 열매까지 맺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주에 있는 집에서 쓴 시로 짐작되는 '살구나무와 창'은 "늙은 살구나무"와 "돌아앉은 창"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천착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살면서 서로, 아니 일방적으로 '나는 늙은 당신'과 등지고 "오래 어둡"게 살아간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늙은 당신이다.
"늙은 살구나무"의 "환한 등쌀에 못 이겨/ 어둠에 젖은 창"을, 마음을 조금 연다. 늙은 당신이 "꽃등 하나가 켜"들고 말을 걸어온 것에 대한 화답이다. 오래 속삭이고, 깊은 속을 알기에 "조금씩" 받아들인 순간 "꽃등의 물결이 순하게도 밀려"든다. 온 집안이, 마음이 환해진다. "오지랖 넓은"이라 했지만 연륜은 무시할 수 없다. 슬그머니 내민 손 잡아주는 마음 또한 예쁘다. "멀리 돌아"(이하 '꽃보다 오랜')왔지만 "꽃보다 오랜 당신은/ 내 생애의 봄꽃"이다. 이제는 오래 동행하는 일만 남았다.
바닥난 바닥이 이끄는 대로 마음 놓고 주저앉은 세 칸 집
이 빠진 기와지붕 아래 부서져 내리는 흙돌담을
단풍손들이 부드럽게 휘감아
쓰러질 듯한 집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담쟁이덩굴은 담 밖으로 손길 한번 돌려본 적 없었다
살갗이 으스러질 듯 자아낸 실핏줄로
흘러내리는 담벼락에 달라붙어
한 몸으로 살아내었다
긴 세월 함께 버텨오는 동안
성한 손 하나 없이 발갛게 아픈 물 들 때까지
담을 움켜잡고 놓지 않았다
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단풍손들의 일생이 허망하게도 찢어진다는 것을 안다
가을 햇살 늦도록 옆을 지켜주는 저물녘
낮은 가락으로 온몸 타고 흐르는 바람의 노랫소리에
아픈 물이 든 단풍손들 애써 뻗어
기울어진 흙돌담을 끝까지 껴안는다
- '동행' 전문
시인은 "발걸음이 가는 대로 동네 한 바퀴 돌아오는 산책길"('저녁에')에 "마음 놓고 주저앉은 세 칸 집"을 본다. 폐가를 지키고 있는 것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흙돌담과 붉게 물든 담쟁이덩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떠나고 집은 무너졌지만 끝까지 그 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담쟁이덩굴이다.
"담 밖으로 손길 한번 돌려본 적 없"는 담쟁이덩굴은 "흘러내리는 담벼락에 달라붙어/ 한 몸으로" 살고 있다. "살갗이 으스러질 듯 자아낸 실핏줄"은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의 내력을 떠올리게 하지만, 폐가가 된 집의 주인이 담쟁이덩굴임을 환기시킨다. 하여 시인은 '단풍들'이라 하지 않고 '단풍손들'이라 하면서 손으로 잡고 있음과 대(代)를 잇고 있음을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픈 물이 든 단풍손들"이 "기울어진 흙돌담을 끝까지 껴안"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것처럼 나와 당신도 죽는 순간까지 동행하자는 결의를 다진다. 마음을 내려놓은, 자연에 동화된 소요자의 행복한 산책길이다.
◇마음을 걸다=이양희 지음. 북인 펴냄. 120쪽/8000원.
 |
김정수 시인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