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제재는 장벽…상당한 실랑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개소했다 북한이 이듬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된 사안인데도 실제로 개설하려고 하니 유엔 제재가 장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제재 때문에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다"며 "(필요 물품을)북한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서 결국 관철시켰다"고도 회상했다.
다만 그가 '실랑이' 거리로 표현한 "컴퓨터 등 업무용 기자재와 발전기"는 북한이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 use) 품목이다. 제재로 대북 제재 반입을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 정상 국가나 기업 간 거래에서도 다양한 제한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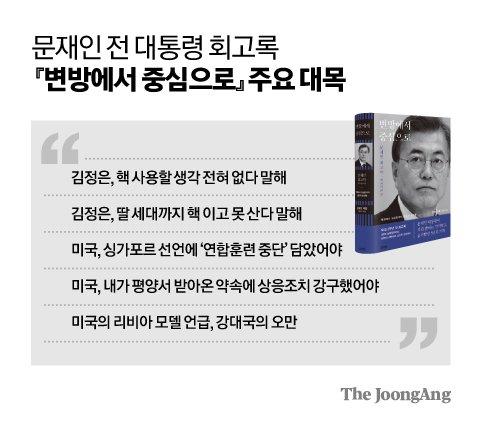 |
김주원 기자 |
문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발된 데 대해서도 사실상 제재 탓을 했다. 그는 "제재를 무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집요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았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마치 제재만 우회할 수 있었다면 사업 재개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인 같은 해 10월 금강산에 찾아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북·미 협상이 꼬이자 남북 협력 상징물부터 없앤 게 북한인데, 문 전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아쉬움만 반복한 셈이다.
 |
2020년 6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당시 노동신문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며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제재 벽 못 넘어 합의 이행 미진"
문 전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도 제재로 인해 빛이 바랬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우리는 2018년 (4월) 판문점과 (9월) 평양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고 실용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결국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답답하고 아쉽다. 화도 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제재를 뚫지 못한다’는 건 당시 북한이 문 정부에 표한 불만의 골자였다. 북한 매체들은 “외세추종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된다”(2019년 7월 노동신문) “외세의 눈치나 보며 북남관계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남조선당국”(2019년 5월 메아리) 등의 주장을 펼쳤다. 문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제재를 탓하는 건 이에 대한 동조처럼 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더해 그는 김정은의 불만도 여과 없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솔직히 힘들다고 토로했다"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제재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은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라고도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부터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까지 총 10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김정은이 이처럼 제재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건 제재가 무기 개발에 쓰이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옭아매는 효과를 내고 있는 방증이다.
 |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현 외무상)이 2019년 3월 1일 새벽(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북한은 미국에 민수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비핵화·제재 해소 과제"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속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했다"며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미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그것을 통해 비핵화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제재를 '해소 과제'로 표현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애로'와 '장벽'으로 묘사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언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 속에 15년 동안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사라진(4월30일 종료) 직후 공개된 것도 걱정스러운 지점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동맹·우방과 함께 기존 전문가 패널의 기능을 대체하는 수준의 새로운 제재 감시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해 고심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대놓고 유엔 제재의 권위에 의문을 표한다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도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 당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가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30일자로 활동을 종료했다. 유엔 웹티비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핵무력 완성서 희망 봤다" 주장도
한편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한 대목은 이외에도 여럿 있다. 그는 자신이 북한에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권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만든 것 모두 시험발사하고 보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 내용도 미국에 전해줬다"면서다. '갖고 있던 미사일은 다 쏴버려 남은 게 없다'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별도의 검증도 없이 사실상 그대로 믿고 미국에게 전해줬다고 시인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에서 "오히려 희망을 봤다"는 주장도 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록 허세라고 하더라도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에 그런 뜻이 숨어 있다고 봤다"면서다.
북한이 이듬해인 2018년 1월 대화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은 협상이 시작되자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은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미국 측은 협상을 파기했다. 애초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 뒤 협상에 나선 건 제재 완화를 노린 것이지, 비핵화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 이유다.
결과적으로 핵무력 완성에서 희망을 봤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냉철한 분석보다는 희망적 사고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