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조의 외설]
尹 대통령 기자회견장 BBC·로이터·AFP 서울 특파원
한국어 몰라 영어로만 취재·질문
尹 대통령에게도 영어로 질문
저널리즘 기본 과목 낙제점
도쿄 특파원이 도쿄에서 일본말을 몰라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돌리기 바빠 책상에만 앉아 있다면? 파리 특파원이 불어를 할 줄 몰라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취재고 뭐도 아무것도 못한다면?
한국과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된 서울 특파원이 한국 주요 일간지도 읽지 못하고 영문 신문만 찾아 읽는다면?
현장의 최전선에서 직접 만나 보고 듣고 물어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인 저널리즘을 생각한다면, 이런 특파원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에 근무할 때 기회가 되면 영·미권의 신문·방송·통신의 서울 특파원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학부 때 저널리즘을 전공한 터라 저널리즘의 선진국 기자들로부터 뭔가 배울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파고드는 집요함과 학구열, 전문성 등을 외신 기자들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 특파원은 예순 넘게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굵직한 정치 사건 현장을 몸소 겪어 웬만한 한국 기자보다 한국 정치를 잘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던 일화를 털어놓으며 실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진짜 정체는 뭘까 갸우뚱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얼마입니까?” “제 이름은 제이크(가명)입니다”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BBC 서울 특파원 맥킨지 기자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어로 질문하고 있다. /YT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채널인 C모 방송사의 본사 파견 서울 특파원은 한국 신문을 가져다줘도 큰 제목조차 읽을 줄 모른 ‘한국어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를 고용해 본사 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주고 번역, 통역, 취재, 섭외, 동향 파악 등을 다 시켰습니다.
영미권 모 유명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 방송의 외신 기자는 종종 한국 문화를 얕잡아보는 식의 트위터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자는 서울에 3년여 주재했는데, 올 때도 그렇고 갈 때까지도 한국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외신 기자 상당수가 영어 할 줄 아는 한국 사람들을 주로 만나며, 이런 경우도 사실 드물고 대부분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을 만나며 한국 사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도 이런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의 민낯이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 4명이 질문을 던졌는데, 일본 신문 기자 딱 1명만 빼고 모두 한국어로 질문을 못 했습니다.
 |
로이터 통신의 서울 특파원 조시 스미스 기자가 질문하고 있다. /YT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로이터 통신 조시 스미스 기자는 “안녕하십니까”라고 한국어로 인사만 하고 영어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AFP 통신의 캐서린 버튼 기자는 한국어 한마디 없이 영어로 질문만 했고, BBC 진 맥킨지 기자도 유창한(?) 영어를 뽐내며 질문했습니다.
‘아니 영미권 매체 기자가 영어로 질문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서두에 밝혔듯 저널리즘의 기본적 소양 문제가 있고, 둘째는 부정확한 외신 보도가 나갈 수 있어서입니다. 아무리 통역사를 둔다고 해도 직접 현지어로 그 사회를 이해하느냐 마느냐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본국에서 파견된 모 매체 서울 특파원이 서울 지국에서 고용한 한국인 기자에게 취재를 다 시켜놓고 기자의 바이라인에는 본인의 이름만 올려 ‘검은 머리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가 직접 한국에서 취재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서울의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알아도 지국 직원들이 번역해준 신문 기사 요약본을 그것도 주요 현안 위주로만 읽고서는 한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리포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현재 연수 중인 워싱턴 DC 조지타운대에서 멀지 않은 포토맥 강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디서 한국어가 들려 귀를 열고 두리번거렸습니다. 한국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듣다 보니 카페에서 튼 음악이 K 팝이었습니다. 네이버 음악 검색을 해보니 ‘뉴진스’의 노래였습니다. 지난 3월말 플로리다 올랜도에 갔을 때도 한 레스토랑에서 K 팝이 나와 그 인기를 실감했는데,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또다시 들으니 더 반가웠습니다.
K컬처가 확산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격의 기자회견 정도에선 외신기자들이 자기가 주재하는 나라의 말로 질문 정도는 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미권 기자들이 괜한 우월감이 혹시 있다면 내려놓고 한국어로 직접 남대문 시장의 상인도 취재하고 신문도 직접 읽고 방송도 듣고 이해하면, 좀 더 정확한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특이하게 외신 기사라고 하면 괜히 공신력이 더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취급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저널리즘의 기본에 소홀한 경우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통 표지판도 읽지 못하는 외신 기자가 한국 정치에 대해 기사를 쓴다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쉽사리 꺼내지 않는 부분인 듯하여 공론의 장에 하나의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져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외설 구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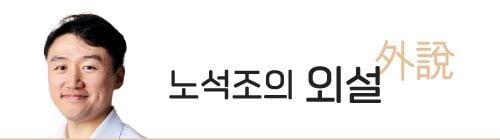 |
☞뉴스레터 ‘외설(外說)’은
미번역 외서(外書)를 읽고 소개하거나, 신문에 담지 못한 뉴스 뒷이야기[說] 등을 들려 드리는 조선일보의 뉴스레터입니다.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받아보시려면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4 로 들어가셔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거나 제 이메일 stonebird@chosun.com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뉴스레터 ‘노석조의 외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노석조 기자·조지타운 방문연구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