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협 역사학자 |
‘해양국가(thalassocracy)’는 고대 그리스인이 미노아문명을 가리켜 쓰기 시작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반도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있던 그리스인은 남쪽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선진문명을 누리고 있던 미노아 세력을 육지세력인 자기네와 대비되는 해양세력으로 본 것이다. 그 후에는 튀로스, 시돈, 카르타고에 퍼져나간 페니키아 세력을 해양국가로 보았다.
그리스인 자신도 해양세력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되었고 지중해 일대에서는 해양세력의 큰 역할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카르타고를 물리친 로마도 해양세력의 역할을 많이 물려받았고 로마제국 멸망 후 베네치아를 위시한 해양세력이 근세까지 중요한 위치를 지켰다.
지중해 일대에서 바다의 역할이 컸던 것은 섬이 많고 항해가 쉬운 조건 때문이었다. 지중해 못지않게 넓은 영역에서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진 곳이 동남아였다. 해양국가는 남양에도 나타나 역사의 전개에 큰 역할을 맡았다.
 |
지중해에서 초기 해상활동이 활발했던 에게해 지역 지형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동남아 지형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해양국가는 ‘그림자 제국’?
흉노 등 유목제국의 성격을 “그림자 제국(Shadow Empire)”으로 규정한 토머스 바필드는 수전 앨코크 등이 엮은 〈제국 Empires〉(2001)에 수록된 논문 “그림자 제국들”에서 해상교역국가를 그림자 제국의 한 형태로 제시했다. 자체 생산력 없이 이웃의 ‘본체 제국(primary empire)’으로부터 재화를 추출한다는 점에 유목제국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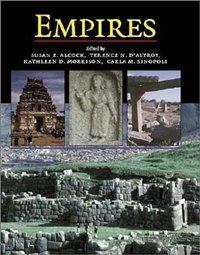 |
Susan E. Alcock, Terence N. D'Altroy, Kathleen D. Morrison, Carla M. Sinopoli, eds., Empires: Perspectives from Archaeology and History . 제국의 형태보다 제국의 관념을 밝히는 데 주력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 |
〈위태로운 변경 Perilous Frontier〉(1992)에서 제기한 ‘그림자 제국’ 개념을 일반화하려는 뜻인데, 생각할 문제가 있다. ‘산업’의 의미를 ‘가치 창출’로 본다면 3차 산업, 즉 상업의 역할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1-2차 산업에서 농업국가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 교역국가가 농업국가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유목국가의 경우와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교역 중심의 해양국가라 하더라도 육상의 1-2차 산업기반이 전혀 없다면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그 기반을 갖추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육상에 상당한 근거지를 손수 가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겠지만, 특정한 육상세력과 공생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손쉬운 형태일 것이다.
남양은 교역이 왕성한 곳이었다. 향료 등 남양의 특산물에 대한 외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교역활동을 시작했고, 다른 지역들 사이의 (페르시아와 중국 등) 교역도 해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항해술을 일찍 발달시킨 남양인의 해상활동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도처에 해양국가가 나타났다.
이들 해양국가 대부분은 항구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넓은 해역을 통제하는 일도 있었다. 스리비자야도 통합성이 강한 제국이 아니라 이런 연대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
그래픽 김영옥 기자 |
항구도시들은 대부분 조그만 강 어구에 나타났다. 강 어구에는 항구를 개발하기에 적합한 지형이 많았고, 상류의 조그만 농경지대와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항구도시를 앤서니 리드는 하나의 일반적 형태로 보고 ‘네게리(negeri)’라고 부른다.
━
농업국가 ‘나가라’와 교역국가 ‘네게리’
리드는 해안의 교역도시를 ‘네게리’라 하여 대륙부 큰 강 유역에 나타난 파간, 앙코르 같은 ‘나가라(nagara)’와 대비시킨다. 어감이 비슷한 이름이지만 어원은 전혀 다르다. 나가라는 산스크리트어 출신이고 네게리는 말레이어 출신이다. (지금도 말레이시아를 구성하는 13개 주의 공식 명칭이 ‘네게리’다.)
‘나가라’는 ‘도시’ 내지 ‘도시다움’을 뜻하는 말이다. 파간이나 앙코르가 ‘나가라’를 자처한 것은 종전에 없던 중심부의 번영을 자랑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중심부를 내세운 것을 보면 국가의 통합성이 아직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다.
‘네게리’는 ‘관문’이란 뜻이다. 작은 강 어구의 항구도시가 상류 농업지대의 관문 노릇을 하는 모습을 그린 말이다. 항구도시의 주민 중에는 외지인이 많아서 내륙 농업지대와 사회적 성격이 크게 달랐고, 내륙의 농산물을 공급받으면서 수산물과 수입품을 내륙에 공급했다.
넓은 평야를 가진 큰 강 유역에서는 대형 나가라가 형성되고 농업지대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는 네게리가 발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리버먼이 ‘헌장 시대’ 주역의 하나로 꼽는 참파도 네게리 형태로 볼 수 있다.(메콩강 삼각주는 아직 농업지대가 아니었다.) 반면 14=15세기 자바섬의 마자파힛을 리드는 나가라로 본다. 리버먼이 대륙부와 해양부를 지나치게 구분하기 때문에 생긴 시각의 차이로 이해된다.
초기의 네게리는 아직 ‘국가’ 형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역활동의 성장에 따라 본격적인 해양국가가 출현하기에 이른다. 남양은 원래 교역이 활발한 곳이어서 항구도시들이 농업세력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고 네게리 구조 안에서 독자성을 지킬 수 있었다. 15세기에 이르면 교역이 한층 더 늘어나면서 말라카를 비롯한 해양국가들이 나타난다.
━
정화 함대가 키워준 교역국가 말라카
넓은 평야가 없는 말레이반도는 참파와 함께 나가라 아닌 네게리의 세계였다. 언어도 해양부와 같은 남양어족이었다. (참파에는 베트남에 통합된 후 남양어 사용이 줄었지만 아직 많이남아있다.) 육상교통보다 해상교통이 우세하던 시기에 말레이반도는 대륙부보다 해양부에 확실히 속해 있었다.
1402년에 세워진 말라카가 곧 명나라의 중요한 조공국으로 떠오른 것은 교역로 상의 위치 때문이었다. 1405년 첫 항해 때 정화(鄭和) 함대는 말라카를 중간기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위상을 세워줬다. 1411년에는 말라카 왕(술탄)이 정화 함대를 따라 북경에 가서 황제를 알현했고, 1431년에는 샴(暹國)이 말라카를 적대하지 않도록 명나라가 중재하기도 했다.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사이의 말라카해협은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고 말라카는 그 해협의 중앙에 있었다. 마자파힛의 공격을 피해 도망 온 싱가푸라(싱가포르 자리에 있던 네게리) 왕자가 자리 잡기 전까지 한적한 어촌이었다는 전설도 있는데, 말라카의 위치와 지형을 보면 그 전에도 조그만 네게리가 존재했을 것 같다. 15세기로 넘어올 무렵 해협을 지나가는 교통량의 급증으로 위치가 부각되는 참에 찾아온 정화 함대의 ‘간택’을 받아 큰 발전을 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화 함대의 활동1405-1433)이 끝난 후 말라카에 대한 명나라의 전폭적 지원은 끝났으나 중국에 대한 말라카의 의존은 계속된 사실을 항리뽀(漢麗寶)의 전설로 알아볼 수 있다. 명나라 공주가 5백 명의 시종을 데리고 말라카 왕에게 시집와서 그곳 중국계 주민의 조상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왕이 항리뽀 왕비에게 선물했다는 부킷 시나(Bukit Cina) 언덕에는 큰 중국인 묘원이 남아있다.
 |
부킷 시나의 중국인 묘원(19세기 말 촬영). 12,000기의 무덤 중에는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서 말라카 역사에서 중국인의 역할을 보여준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르투갈인이 인도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탈취한(1511) 곳의 하나가 말라카였다. 인도양 제해권을 위한 열쇠로 본 것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인의 손에 들어가자 말라카의 역할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항해술의 발달과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포르투갈인의 횡포를 피해 가는 다른 항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의 순다해협을 지나 수마트라섬의 반대편(서쪽)으로 지나가는 항로였다.
 |
중국풍과 포르투갈풍이 결합된 말라카의 이 건물은 정화를 기념하는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태평양의 또 하나 불가사의 ‘난마돌’
텔레비전에서 난마돌(Nan Madol) 유적에 관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강화도보다 조금 큰) 한 모퉁이에 한 무더기 인공 섬으로 만들어진 거석문화 유적. 해양국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참인지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위키피디아〉를 뒤져봤다.
필리핀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캐롤라인제도의 폰페이섬이다. 섬 동쪽 조그만 부속도서(템웬)의 남쪽 해안을 따라 산호초 위에 현무암 석재로 만든 92개 인공 섬이 하나의 조그만 수상도시를 이루고 있다.
 |
미크로네시아연방의 수도 팔리키르가 폰페이섬에 있다. 그래픽 김영옥 기자 |
 |
그래픽 김영옥 기자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난마돌 유적의 일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고학 연구를 통해 이 수상도시의 건설이 12세기 말에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략 1.5 x 0.5 킬로미터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유적의 거주 인구는 1천 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지금 3만5천 명 가량인 폰페이섬 인구가 당시에는 2만 명대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난마돌 거주자들은 그 지배자였을 것이다. 그 지배력이 폰페이섬 밖에까지 미쳤을 여지는 별로 없다. 수백 킬로미터 내에 다른 큰 섬이 없으니까.
폰페이섬 지배자들이 왜 이런 수상도시를 만들었을지, 그럴싸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본섬 안에 궁궐을 만들면 힘도 덜 들고 생활도 더 쾌적했을 텐데. 해양국가의 성격에 관해 밝혀진 것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례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