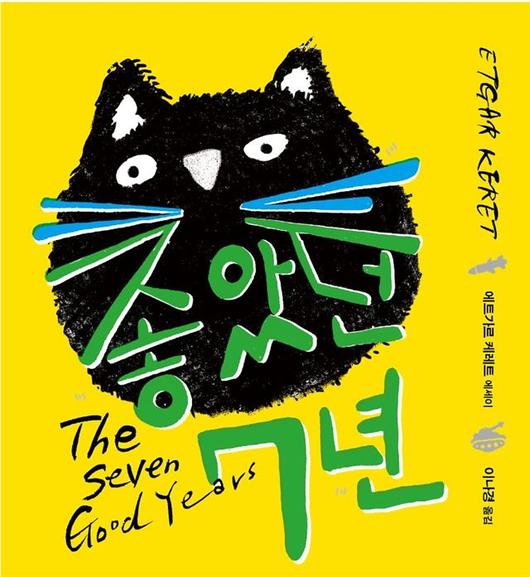 |
'좋았던 7년' 책 표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은 나와 한 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면 나는 역에서 내릴 것이고 우리는 아마 다신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태어나면서 시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이 7년 간의 여정에서 무엇이든 한 가지는 당신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란다.’
작가가 에세이로 풀어낸 7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대목이다. 대뜸 이별을 선언하는 첫 만남, 시니컬하고 사실적이다. 이 말투는 7년의 시간을 풀어놓는 내내 이어진다.
노벨상을 무더기로 쏟아내는 민족답게 ‘좋았던 7년’을 쓴 에트가르 케레트도 독특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무기로 평범한 일상을 서슴지 않고 전복시킨다.
‘앵그리버드’ 게임도 그의 날 선 비판 정신에 걸려든 사냥감이었다. 그는 ‘앵그리버드는 사실 종교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의 정신과 일치하는 게임’이라고 못 박는다. ‘앵그리버드’를 지배하는 논리가 텔레반이나 IS와 다르지 않다니! 그의 설명은 이렇다.
‘무장도 하지 않은 적의 집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몰살하며, 그것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게임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네모난 머리를 한 새들을 석벽으로 쏘아 올리는 것은 내가 이생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자살 테러와 가장 가까운 행위이다.’
‘앵그리버드’가 ‘남의 것(알)을 훔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하는 순수한 게임일 수도, ‘내 것을 훔치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구든지 죽여라’는 신념을 심어주는 세뇌수단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후자의 가능성을 누가 무시할 수 있을까.
비판은 날카로우나 에세이에 담긴 일상의 모습은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가족이 있고, 일상에서 겪는 기쁨, 슬픔, 우울함 그리고 소소한 재미도 알뜰하게 담겨 있다. 다만 불안이나 우울에 저항하는 방식이 특별하다(혹은 유대인답다). 작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사는 게 좋아요. 삶의 질이 좋으면 다행한 일이지. 하지만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난 까다롭지 않아요.’
언뜻 체념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은 숱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유대인들이다. 이 가족은 가정 절망적일 때도 체념을 거부한다. 아버지는 ‘농담’으로 체념의 상황에 반항한다. 암에 걸렸을 때도 그랬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상황이 바닥을 칠 때 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상황이 어찌나 암담한지 결국 이보다는 나아지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 세상 낙관이 아닌 느낌마저 든다. 이 대목에서 예리하고 생각이 많다는 게 그저 불평이 많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상쾌한’ 깨달음을 얻는 독자가 많을 듯.
특히 ‘상황이 바닥을 칠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곱씹을수록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아버지가 스스로 자주적인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난 문장이 아닐까. 그건 그 어떤 시련도 결국 어느 순간 썰물처럼 쓸려나간다는 확신일 것이다. 멋있다!
아버지의 죽음 즈음, 열차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다. 작가가 서둘러 말했던 것처럼 이윽고 헤어질 시간이었다. 작가와 여행하는 동안 수십 가지의 말과 깊은 인상을 마음에 얻었다.
책을 제대로 읽은 독자라면 작가가 역에 내린 후에도 홀로 기차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와 함께 했던 ‘좋았던 7년’이 끝나고 ‘좋았던 7년, 이 이후’를 이어가는 것이다. 매섭고 예민한, 혹은 한없이 현실적이면서 긍정적인 삶의 면모를 찾아 떠나는 일상 탐구 여행이다.
김지언 자유기고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