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터넷 검열 방지 청원 24만명 목전
전문가들 "인터넷 검열은 과도한 우려"
접속주소정보는 기존 HTTPS로도 못 가려…기술적 오해 多
"정책 발표 전 정교한 사회적합의 과정 거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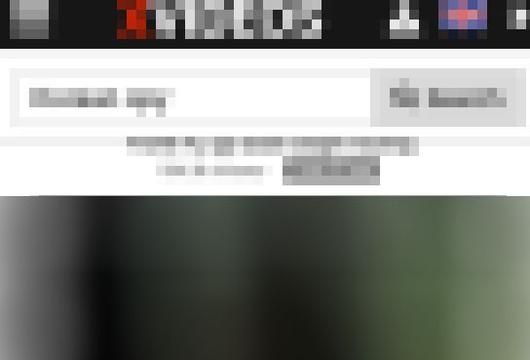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황진영 기자] 정부가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https 차단 정책'을 도입한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8일 오전 10시 현재 23만7000명을 넘었다. 지난 1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국민 청원은 6일 만인 17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https 차단'은 음란물 또는 불법 도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해외 유해사이트를 더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존에 널리 사용됐던 통신 프로토콜인 'http' 방식보다 보안이 더 강화된 강력한 차단 기술이다.
해당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막고, 웹툰 등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인터넷 감청'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가 내놓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영역 차단 조치가 인터넷 이용시 주고 받는 데이터(패킷)을 도ㆍ감청한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이용을 편지를 보내는 행위에 비유하며 "이번 차단 조치는 편지봉투 내의 내용물(패킷)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접속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는 기술만 바뀌었을 뿐 기존 불법사이트 차단에서도 계속 유지됐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https 차단 논란도 과도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https는 웹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오가는 정보를 암호화할 뿐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했는지는 감추지 않는다"며 "기존의 모든 기술만으로도 ISP들은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ISP 웹사이트 접속 정보를 아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며 "이들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정부 차원에서 감청을 하려고 해도 법원의 명확한 동의와 통신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범죄나 탈법이 아닌 이상 법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리 만무하며, 기업들도 사회적 반발과 이미지를 고려하는 만큼 단순히 정부 압박만으로 협조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기술 수준을 떠나 정책 발표에 앞서 보다 정교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교수도 "중국은 '그레이트파이어월'이라는 강력한 기술로 모든 인터넷을 검열하지만 이미 많은 우회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의 완전한 검열 자체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국민들 입장에선 중국처럼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단순 기술적인 해명이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를 공감하고 설득하는 차원의 해명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뿐만 아니라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