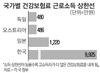 |
보장성이 높은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서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은 만큼 돈을 더 내는 '수혜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병원을 자주 방문해 국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프랑스는 의료보험에서 해마다 약 300억프랑(당시 환율로 약 6조원)의 적자를 내다가 2000년대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동시에 과잉 진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나간 게 주효했다. 필수 약제가 아닌 의약품 대부분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일당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독일은 인구 중 90%를 위한 공공건강보험과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고소득층(인구의 10%)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을 별도로 운영한다. 네덜란드 역시 고소득자는 별도 민간의료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보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중시한 까닭이다.
싱가포르는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전제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3M(Medisave, Medishield, Medifund)을 도입해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다. 국민 각자가 은행 통장과 비슷한 '의료계정'을 만들어 병원에 가면 금액이 빠져나가게 해 평소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영국식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환자 본인 부담이 10%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는 1980년대 수혜자 부담 체계로 바꿔 국민총소득(GNI) 대비 의료비 지출이 4.9%(2017년 기준·미국 17.1%, 한국 7.6%, OECD 평균 8.9%)지만 '저부담 고효율'로 동남아 최고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