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너무 맞는 말 한다"
보수신문조차 "대통령실 자제하라"
 |
왼쪽 사진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과정이 마치 '숙청'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벌이는 각 후보와의 정면충돌이 도가 지나치다는 취지에서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러다가 딱 한 분만 남겠다"며 "'적'이라는 말이 참 섬뜩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해 '국정운영의 방해꾼', '적' 등의 표현으로 안 의원을 겨냥한 일을 꼬집은 것이다.
진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원래 숙청의 메커니즘은 기계적인 것, 연안파 제거하고 소련파 제거하고 남로당파 제거하니 김일성만 남았다"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도 썼다.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견제 속에 당권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당대회 무대에서 사라져 온 과정을 숙청에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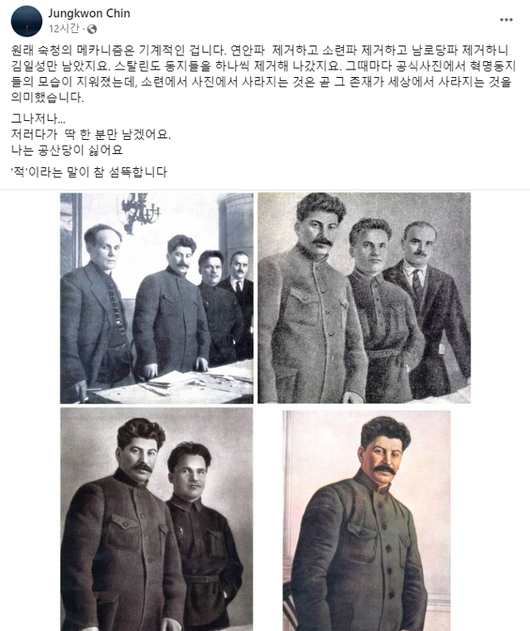 |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페이스북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진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너무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며 "진중권 아저씨를 숙청합시다"라고 너스레를 놓았다.
앞서 5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측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실체가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표현을 운운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자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자 적"이라고 말했다. 또 "윤핵관은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이 아니다", "윤핵관 표현을 쓰는 인사는 국정운영의 방해꾼" 등의 언급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안 후보 측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에 항의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누가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냐"는 공개 비판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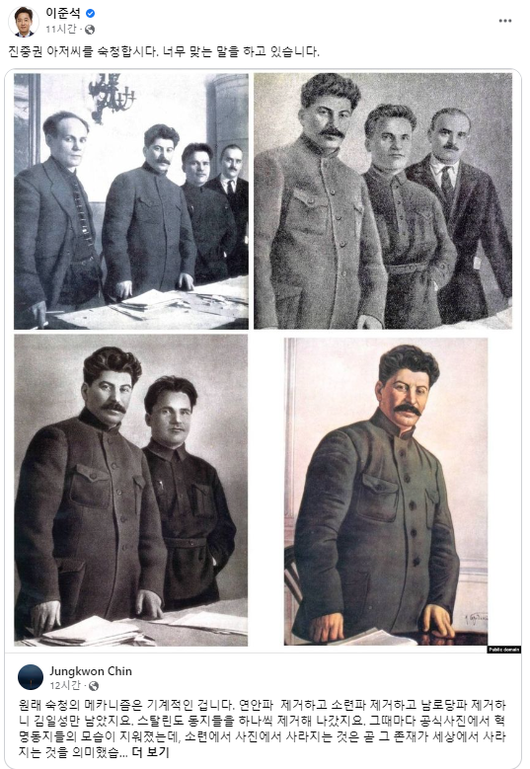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페이스북 캡처 |
'숙청'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한 것은 특정 인사들에 대해 거듭된 일각의 공세가 '후보 정리'라는 비판을 받은 탓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파동 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 1위'를 달리던 유승민 전 의원 출마 견제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되고 대통령실과 윤핵관 세력의 집중 공격에 시달리다 못해 출마를 포기했다. 다음 공세는 안 의원을 향해 쏟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나선 정면충돌이 거듭되자, 보수신문에서까지 "막장 양상"이라는 비판을 내놓으며 경고등을 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5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전날 사설을 소개하며 "몇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앞서자,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심이 안철수 의원에게 향하고, ‘윤심’이 아니라는 뜻을 연일 내비치고 있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안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며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서 노골적으로 파열음을 내는 것은 처음 본다"고 썼다. 또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당대표 경선까지 매사에 나서서 안 의원을 공격하고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이 결국 반격에 나서면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지금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확실하게 중립 의지를 밝혀 윤심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