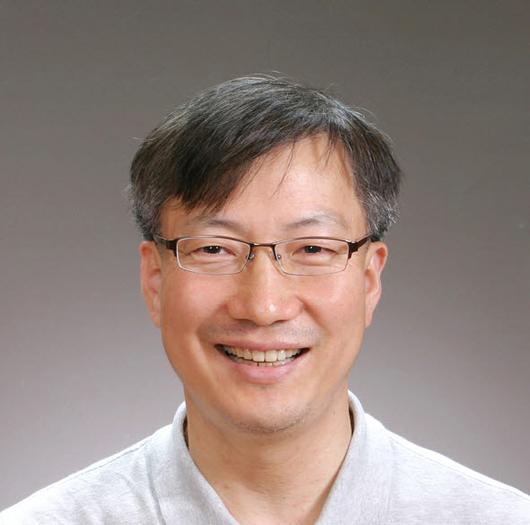 |
이현우 단국대 교수(5G포럼 국제담당 부집행위원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4월 한국은 세계 첫 5세대(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며 막대한 경제 효과와 통신 선도 국가로의 새 시대를 예고했다.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5G 기술 확산이 둔화하며 5G 시장과 5G융합 산업에서 뒤처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5G 연결성과 커버리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 관심이 식으면서 보급률이 둔화하는 현실 때문이다. 빠른 증가 폭을 보이던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활기를 잃고 있다. 5G 서비스와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투자를 늘리려던 이통사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5G 성장세 둔화의 근본 요인은 4G 롱텀에벌루션(LTE) 대비 차별화한 5G만의 독특한 서비스 부족이다. 5G의 주요 특징은 6㎓ 이하 주파수 대역과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 대역을 함께 활용해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대역을 모두 활용해야 5G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접목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5G는 올해 1분기 기준 6㎓ 이하 주파수 대역만 활용한다.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다. 그마저 국내 5G 인프라 가운데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고 85개 시 단위를 우선으로 망이 구축돼 5G 가입자라도 커버리지를 벗어나면 LTE로 전환된다. 반쪽짜리 서비스마저 미완의 망 구축으로 전국 서비스는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5G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6㎓ 이하 주파수 대역에 비해 속도와 용량 면에서 우위에 있는 밀리미터파 대역 28㎓ 활용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초고속·초고용량·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한 밀리미터파는 6㎓ 이하 주파수 대역 대비 약 8~10배 많은 용량을 수용, 데이터 전송에 탁월하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심이던 4G와 달리 5G는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등 여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은 재빠르게 밀리미터파 도입을 추진해 초기 가정용 중계단말기(CPE)를 이용하는 고정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동서비스로 확대, 진정한 밀리미터파 기반 5G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28㎓ 대역 지원 5G 통합형 기지국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버라이즌은 30여개 도시에 최초로 밀리미터파 인프라를 구축해 28㎓ 대역을 활용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AT&T는 지난달 초 39㎓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진정한 5G 기술 구현의 필요성에도 이른바 '반쪽짜리' 5G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5G 가입자의 정체 추세는 불가피하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서비스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5G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5G 인프라 확충과 밀리미터파 인프라에 대한 이통사의 조기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밀리미터파 망을 구축해 이르면 연말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이 어렵게 잡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 콘텐츠, 저지연 특성 등 다방면에서 소비자들이 5G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동력이 떨어진 5G 시장에 밀리미터파라는 새로운 엔진을 일정을 당겨서 더 일찍 가동해야 한다. 다만 밀리미터파 네트워크는 애초부터 광역 커버리지를 주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핫스폿을 중심으로 집중 구축, 소비자가 5G 서비스 차별성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5G는 서비스 혁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5G 플러스 전략에서 보듯이 제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융합에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산업 간 융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산업 간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민간과 더불어 공공에서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현우 단국대 교수·5G포럼 국제담당 부집행위원장 woojaa@dankook.ac.kr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