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그 빛과 그림자
-페르메이르의 신비한 능력
처가에 얹혀산 '데릴사위 처지'
열명 넘는 아이 등 주변 압박 속
미묘하고 섬세한 미학 차분히 추구
세상 떠난지 200년 후 '재발견'
고흐·렘브란트와 같은 반열 올라
어려운 여건에도 자기 세계 고수
'성공한 예술가' 평가될수 있을것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1632-1675)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완전히 잊혔다가 지난 1860년대에 프랑스 비평가 토레 뷔르거의 노력으로 빛을 봤다. 죽은 지 두 세기가 지나서야 ‘재발견’된 것이다. 남긴 작품이 많지 않았고 목록도 정리되지 않았던 터라 그의 작품은 새로 발견될 때마다 관심을 끌었다. 그러다 보니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커다란 위작 사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영롱한 눈빛으로 관객을 돌아보는 ‘진주 귀고리 소녀’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로 불리고 있고 오늘날 페르메이르는 반 고흐,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됐다.
페르메이르를 ‘수수께끼의 화가’라고 한다. 자화상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내면의 어둠과 갈망을 토로한 기록도 없어 예술가로서 무슨 생각을 하며 뭘 느꼈는지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예술가에 대해 잘 알려면 당사자의 내면, 감정을 기록한 글, 예술과 작품에 대한 예술가 자신의 육성을 접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은 뭔가 제어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닐까. 또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 ‘뮤즈’와의 사연도 있지 않을까.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소설 ‘진주 귀고리 소녀’와 소설을 바탕으로 한 같은 제목의 영화는 페르메이르의 내면에 대한 상상을 그의 작품과 솜씨 좋게 엮은 걸작들이다. 실제로는 페르메이르의 뮤즈가 누구였는지, 뮤즈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기나 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그가 새로이 명성을 얻게 된 뒤로 연구자들은 페르메이르를 둘러싼 온갖 기록을 발굴하고 검토해 그의 삶을 재구성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세계 최강의 해운국이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예술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에서 예술가들은 이탈리아처럼 가톨릭교회의 굵직한 주문을 받을 수 없었다. 네덜란드 시민들은 쉽게 구입해 집을 꾸밀 수 있는 작은 그림, 신화나 전설을 묘사한 허황된 그림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묘사한 그림을 좋아했다. 또 그림에는 종교적·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인기가 있었던 얀 스테인 같은 화가는 온갖 집안일과 난잡한 잔치판을 그렸다. 한편에는 피터르 더 호흐나 가브리엘 메취처럼 일상을 차분하게 묘사한 화가들도 있었는데 페르메이르는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페르메이르는 델프트에서 태어났다. 그림 공부를 위해 이탈리아 쪽으로 여행하지 않았을까 짐작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생애를 델프트에서 보내고 그곳에서 죽었다. 예술가는 견문이 넓어야 한다고 여기는 요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우물 안 개구리에 가깝다.
발타자르 드 몽코니라는 프랑스 사람이 페르메이르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고 남긴 기록이 인상적이다. “그림이 한 점도 없었다.” 결국 드 몽코니는 작업실을 나와 근처 빵집으로 가야 했다. 페르메이르가 빵값 대신 내준 그림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여러 점의 그림을 동시에 그렸다. 오래 건조시키면서 천천히 그려야 하는 유화의 특성 탓이다. 하지만 페르메이르는 한 번에 한 점씩, 이 궁리 저 궁리를 해가면서 한 해에 겨우 두세 점씩 그렸다. 그러다 보니 완성작을 누군가에게 넘긴 직후나 새 작품을 구상하는 중에는 작업실이 비었다. 어찌 보면 매우 한가로운 예술가의 모습이다.
페르메이르는 데릴사위 같은 처지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부유한 처가에 얹혀살았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여관에는 대출금이 많이 끼어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었고 장모인 마리아 틴스가 소유한 농지가 집안 살림을 지탱했다. 부인과 20년을 함께 살면서 열 명이 넘는 아이를 얻었다. 장모의 재산 관리를 도왔으며 당대의 다른 화가들처럼 미술품을 감정하고 매매했다. 페르메이르를 둘러싼 환경은 아무리 봐도 한가롭지 않다. 이왕 작업실을 갖추고 그림을 그릴 것이라면 잘 팔릴 만한 내용으로 부지런히 그려야 했을 터다. 장모는 애초에 페르메이르를 좋아하지 않았고 화가로서의 역량도 의심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널리 인기를 끌지는 않았지만 몇몇 애호가들의 환대를 받았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페르메이르가 2~3배쯤 빠른 속도로 작업했더라면 돈을 좀 벌었을 것이고 살림에도 보탬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페르메이르는 자신의 리듬을 고수했다. 비싼 안료를 사서 작업실 구석을 배경으로 삼아 부엌 살림살이, 어린아이들이 아닌 수수께끼 같은 여성이 빛 속에서 꿈을 꾸듯 서성이며 편지를 쓰고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만 그렸다.
페르메이르의 경우를 보면 ‘예술가의 성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페르메이르는 성공한 예술가일까. 그는 생산력이 좋지도 않고 실속도 없는 예술가였다. 당대에 이렇다 할 명성을 누리지도 못했다. 오늘날 그의 작품 하나하나는 찬탄을 자아내고 더할 나위 없는 밀도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이런 점들이다. 어떻게 그는 자신을 질시하는 장모를 누그러뜨렸을까. 그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건사하고 살림과 육아에 지친 부인은 어떻게 달랬을까. 재산 관리, 미술품의 감정과 매매,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 그는 매우 분주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미묘하고 섬세한 미학을 차분하게 추구했다.
페르메이르가 성공한 예술가라면, 그건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 발굴돼 유명해졌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생전에 주변의 압박을 견뎌내고 제어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이연식 미술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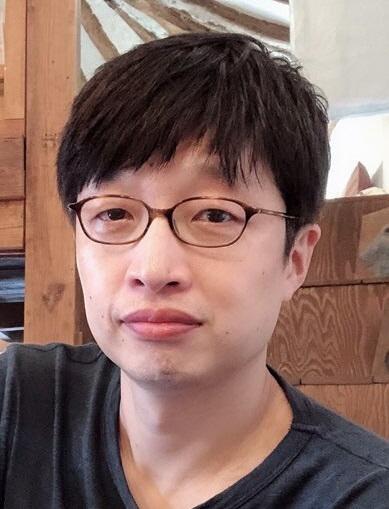 |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