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 국가' 국내 첫 번역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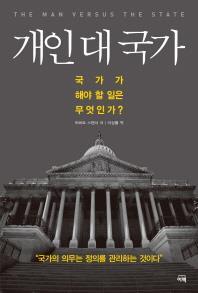 |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이자 철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1820~1903)는 생전에는 찰스 다윈으로부터 "나보다 몇 배는 나은 위대한 철학자"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잘 나가던' 학자였다.
그러나 1세기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이라는 말로 유명한 사회진화론의 선구자로 비난받으며 가난한 이들의 공적(公敵)이자 기득권자들의 친구로 전락, '저주받은 사상가'가 됐다.
스펜서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오해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그가 내세운 '적자생존'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었지만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강자생존'의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펜서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다',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했다', '자유무역을 통한 소수 자본가의 독점을 인정해 기업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스펜서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가 실제로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반대한 평화주의자였으며, 그가 반대한 것은 국가의 모든 간섭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제국가였다는 점이 간과됐다고 반박한다.
최근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된 스펜서의 1884년 저작 '개인 대 국가'(원제: The Man Versus the State)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그의 자유주의적 견해가 잘 드러난 저작이다.
이 책에서 스펜서는 그를 둘러싼 통념과는 달리 "나는 개인들, 개인들의 단체나 계급에 대한 국가의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그것이 현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그 이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 밝힌다.
다만 그는 정부의 역사적 기원이 침략 또는 침략의 방어, 즉 전쟁에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 큰 악을 복종시키고자 악한 수단을 써야만 하는 정부는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면 부도덕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스펜서는 강조한다. 더불어 정부의 간섭으로 개인이 자율성과 창의력을 잃고 무력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의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업 규제나 국민 교육 등이 아니라 '정의를 관리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침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본래 임무라고 스펜서는 주장한다.
그는 정부에 소극적인 '심판' 역할뿐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관'의 몫도 주문했지만, 국가가 운용하는 복지제도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사회적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한쪽의 고통을 줄이고자 다른 쪽의 고통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스펜서는 국가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자비심에 기초한 개인적 자선을 제시한다.
국가 권력의 비대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 관료주의의 폐해, 입법자들에 대한 막연한 의존 등은 21세기에도 여전한 논쟁거리다. 그 틈새를 비집는 자발적 개인과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스펜서가 이 책을 썼을 당시보다 세상은 엄청나게 복잡해졌지만, 그가 던진 화두 중 일부는 지금도 곱씹어볼 만하다.
이책. 이상률 옮김. 252쪽. 1만5천원.
pul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